
남북 분단은 이 시대 마지막 냉전의 유산이다. 뒤를 돌아보면 한반도 슬픈 역사의 굴곡에 잠겨 숨이 막혀 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한국 영화감독들의 특권과도 같은 것이다. 피부로, 가슴으로 느껴온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을 다룬 영화는 늘 우화처럼 그려지기 일쑤였다. 왜 그럴까? 그 또한 기억이다. 남북을 정면으로 들여다볼 수 없게 훈육됐기에 에둘러 얘기하곤 빠져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손쉬운 일이겠다.
'강철비2: 정상회담'(감독 양우석)이 '정상회담'이란 부제를 달고 3년 만에 속편으로 관객을 만난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야기가 이어지는 속편은 아니다. 다만 양우석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와 연출을 했고, 남북의 쿠데타를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라는 점에서 속편의 틀 속에 넣고 있다.
이 영화는 남북과 이해관계에 있는 미중일의 역학에 감독의 상상력을 더해 만든 영화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도자 셋이 평화협정을 앞두고 북한의 일부 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납치된다는 설정이다.
미국은 발칵 뒤집혀 힘을 쓰려고 하고, 남한은 총리체제로 대응에 나서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일본은 이 기회를 틈타 독도 야욕을 불태우고, 중국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종만 하려고 한다. 이 정도는 누구나 예상하는 이야기다.
과연 감독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떤 플롯으로, 어떤 개연성을 주면서 관객에게 자신의 상상력을 풀어낼까.
1편에서는 북한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치명상을 입은 위원장이 남한으로 피신한다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2편은 남북미의 수뇌가 단체로 납치돼 북한의 핵잠수함에 갇힌다는 설정이다. 영화는 남북미 세 국가의 정체성을 세 캐릭터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미국 대통령 스무트(앵거스 맥페이든)는 직설적이며, 호전적이고, 협상의 달인이다. 그 어떤 천박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북한 위원장에게 '헤이, 키드(아이)'라 하고, 남한 대통령에게는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아닌 '미스터 한'이라고 부른다.
북한 위원장 조선사(유연석)는 젊고 똑똑하면서 영어도 잘하고, 구글과 유튜브도 하는 신세대 인물이다. 이 둘은 당연히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떠올리게 한다.
남한 대통령 한경재(정우성) 또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온 몸을 던지는 인물이다. 북미 틈바구니, 평화협정에 사인할 공간도 없지만 이를 성사시켜야 할 책무를 온몸으로 표현한다.
여기에 쿠데타를 일으킨 북한 호위총국장 박진우(곽도원), 북한 잠수함 부함장 장기석(신정근) 등의 갈등이 극을 이끌어간다.
이 영화를 가능케 한 상상력의 토대는 지극히 평면적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과 등장인물의 성격과 태도, 쿠데타의 발생과 과정, 진압 등이 전혀 새롭지도, 힘이 있지도 않다. 상상력은 '어메이징'을 담보로 하지만, 영화는 선실에 갇힌 세 지도자들처럼 답답하기만 하다.
테이블에 놓인 답안지(상상력)가 그렇다면, 이를 변주할 힘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강철비2'는 한반도의 갈등을 우화와 블랙 코미디로 쉽게 그려내고, 평화 통일의 당위성을 웅변하는 것으로 '자기만족'한다. 상상력을 밀도 있는 스토리로 응축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가족적이고 교육적이며, 재미있고, 상징적인데다 긴장감도 넘치는 영화는 과욕이다.
'강철비2'는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잘 해설한 다이제스트의 장점은 있다. 일본 극우의 발악과 이해관계에 목을 매는 미국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을 캐릭터들을 통해 생생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잠수함 내 전투와 일본 소류급 잠수함과의 대치 등은 긴장미가 넘친다. 잠수함 수면 상승과 어뢰의 순항에서 CG는 완성도가 낮아 아쉽지만 독도에서 펼쳐지는 해전이라 비장미까지 느껴진다. 소노부이(음파 탐지 부표) 능동소나(음파 레이더) 기만어뢰 폭뢰 등 실제 전투에 사용되는 무기를 자문을 거쳐 묘사했다고 한다.
'강철비2'는 남북의 대의적 미래를 진정성 넘치게 제안해 주는 영화가 되길 바랐는데, 그 또한 필자에게는 과욕이었는지 모르겠다. '변호인'을 만든 그 감독이 맞는지 의문마저 든다.
문화공간 필름통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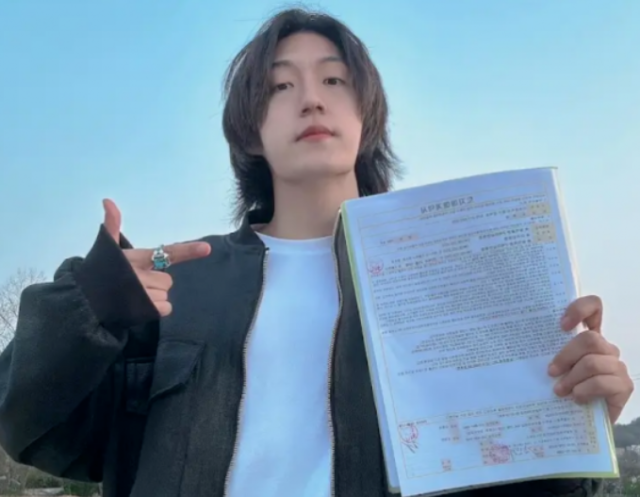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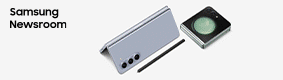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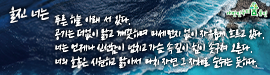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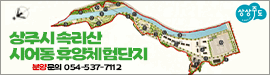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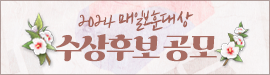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거대야당 특검 폭주에도 '대통령 탓'만…무기력한 국힘
與 총선 참패 후 첫 패인 분석 세미나…"영남당 탈피해야"
대통령실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검토된 바 없어"…전면부인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재차 촉구
'21조' TK신공항 시대 누가 열까…건설사들 물밑 수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