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라는 길을 택한지 어느듯 28년차.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많은 파트를 돌며 환자분들을 돌보며 희로애락도 함께하고 보람도 많이 느끼며 일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해봤지만 요양병원이라는 곳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함께 생활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하루의 시간보다 어르신들과 보내는 하루의 시간이 더 길다보니 자연스럽게 환자분의 가정사나 개인사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있는 20대 막내 동생을 돌보기 위해 결혼도 않은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40대 형님, 손주를 자식처럼 키워온 90대 할머니를 위해 눈물 흘리는 어린 손자, 간호사인 내가 친구인 어르신 등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보내야만 하는 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맘의 문을 닫고 환자분들을 돌보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4년전 우연히 만난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고 함께 지낼 가족이 여의치 않아 막내 아들을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김봉수 아버님. 훤칠한 키에 젊었을때는 꽤나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법한 외모, 발 통증으로 지팡이 없이는 잘 걷지 못하고 오랜 고된 농사로 비록 손가락은 굽어져 불편하나 항상 웃어주며 긍정적이셨던 김봉수 아버님. 다니시던 동산병원 외진을 가시기 위해 김봉수님을 모시러온 아드님을 만나고 보니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날부터 김봉수 아버님은 "간호부장"이 최고의 빽이었습니다.
고향인 김천에서 평생을 열심히 농사 짓고 겨울이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몇날 며칠씩 여흥을 즐길 줄도 알던 멋진 분이셨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연세가 80이 됐을 즈음 갑작스런 집안의 변고로 가족들이 뿔뿔히 흩어지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김봉수 어르신은 술을 벗삼아 병을 키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막내 아들이 주말마다 아버지를 돌보았으나 깊어지는 병세는 막을수 없어 결국 발가락 절단을 하고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선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특유의 유쾌함으로 즐겁게 생활하시는 듯 했으나 창밖으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 보시며 앉아 계실 때 뒷모습으로 보여지는 아버님의 외로움은 어느듯 닫혀 있던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동향, 친구 아버지 라는 공통 수식어가 집에 계시는 제 아버지를 떠 올리게 만들며 나도 모르게 "김봉수 님"에서 "아버지"라고 호칭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봉수 아버지와 나는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팔달요양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김봉수 아버지는 "부장이 가면 나도 가야지" 하시며 막내 아들 집과 멀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따라 오셨습니다. 아들 또한 아버지는 자식들보다 부장을 좋아한다고 동행을 허락 했습니다.
어느새 만난 지 4년.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지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많아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나도 그리웠을 텐데 보고싶다는 말씀 조차도 입밖에 내놓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계시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팔달요양병원으로 옮기시고는 하늘정원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야만 다닐수 있게 되었지만 아버님은 하늘 정원 산책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산책을 할때면 포도 농사 이야기며 제 나이보다 일찍 입학시킨 막내 아들 이야기를 자주 하시며 그리움을 달래곤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전 김봉수 아버지는 갑자기 식음을 전폐 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를 보고 나면 벌떡 일어나셨는데 이번엔 경우가 달랐습니다. 아무리 달래드려도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흥재 부를까요?" 아버지는 바로 "응"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연락하고 다음날 대면 면회를 시켜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들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 너 힘들게 안할게"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일어나시겠지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김봉수 아버지는 그렇게 이뻐하던 내 얼굴도 못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침상,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하늘정원을 보면 아직도 김봉수 아버지가 떠 오릅니다. 주머니속 오래된 지갑, 그안에 꽁꽁 숨겨 놓은 용돈, 나에게 선뜻 만원을 내주시며 맛있는거 사먹으라시던 아버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 조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김봉수 아버지, 김봉수 어머니와 정을 나누며 오늘을 또 보냅니다.
----------------------------------------------------------------------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매일신문이 함께 나눕니다. '그립습니다'에 유명을 달리하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 밖의 친한 사람들과 있었던 추억들과 그리움, 슬픔을 함께 나누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전하시면 됩니다.
▷분량 : 200자 원고지 8매,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1~2장
▷문의 전화: 053-251-1580
▷사연 신청 방법
1. http://a.imaeil.com/ev3/Thememory/longletter.html 혹은 매일신문 홈페이지 '매일신문 추모관' 배너 클릭 후 '추모관 신청서' 링크 클릭
2. 이메일 missyou@imaeil.com
3.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매일신문 그립습니다' 검색 후 사연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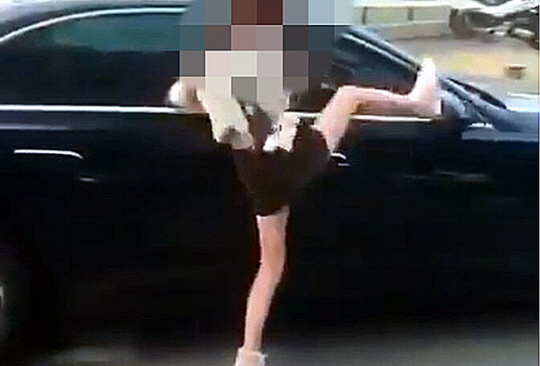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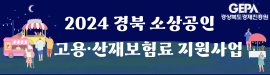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유승민 "이재명 유죄, 국민이 尹 부부는 떳떳하냐 묻는다…정신 차려라"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
"고의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1심 무죄
대구경북 대학생들 "행정통합, 청년과 고향을 위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