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는 음악이 끝난다. 나는 도대체 노래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콧소리를쥐어짜는 말을 노래라니. 음악이 사라지자 속이 후련하다. 무대 춤꾼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블루스가 흐른다. 아직 악단과 가수는 보이지 않는다. 중년짜리한 쌍이 무대로나온다. 다른 패도 나온다. 남자와 여자가 붙는다. 순옥이가나를 껴안는다. 내게 몸을 바짝 붙인다. 내 허리를 감은 손에 힘을 준다. 내몸에 닿는 순옥이의 말랑한 살이느껴진다. 나는 순옥이의 발을 밟을 것만 같다. 쪼작걸음을 뗀다. 순옥이가 내 몸을 끌고, 민다. 뺨을 내 뺨에 붙인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른다. 술냄새도 난다. 우리 옆에 춤을 추는 쌍은 둘다 꽁지머리다. 청바지다. 재수생 같다. 한녀석은 분명 남자다."오빠, 사랑이 뭐지?"
순옥이가 묻는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섹스는 지겨워. 하고 나면 허무해. 취해서 하는건 더 싫구. 섹스가 왜 사랑의 전부가 됐을까"
순옥이가 내 목덜미에 속삭인다. 나는 가만 있다. 나도 순옥이와 그 짓을 했다. 겨울밤이었다. 순옥이는 취해 있었다. 그 짓을 할 때는 취해 있지 않았다.나는 그 짓이 처음이었다. 순옥이가 내 몸을 받으며 울었다. 순옥이는 오빠 이야기를 했다. 나는 시애를 생각했다. 순옥이 오빠는 다리 저는 장애자였다. 시애가 보고 싶었다. 순옥이는 오빠가 자살했다고 말했다.
"섹스가 지겨울때, 시우오빠를 생각했다. 시우오빠하곤 섹스를 빼버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앴어. 낮에 강을 따라 걷구, 등산두 하구. 그냥 그런 밍밍한 사랑. 헐떡이는 것 말구. 내가 라면 끓여 주면 같이 먹구. 내가 오빠 옷도빨아주구. 안보면 보고 싶구, 그 얼굴이 기다려지는 사랑 같은 것. 밤에 옷 벗는 것 말구, 낮에 옷 입구, 눈으로 보는 사랑. 그럼 맑은 하늘도 보이구, 날으는 새도 보이구, 꽃도 예뻐 보일거야. 하찮은 들꽃두…"
순옥이가 끝없이 속삭인다. 취한 목소리다. 아직은 덜 취했다."고향에 가고 싶어"
내가 말한다. 그곳엔 맑은 하늘이 있다. 날으는 새도 있다. 들꽃도 많이 핀다. 노경주는 아우라지에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나를 기다릴 것이다.
"언제 오빠 고향에 한번 같이 가. 강원도 산골이랬지? 이 시궁창을 빠져 나가자구. 맑은 공기 쐬구 와. 걸레같은 몸, 산골 물에 박박 치대구 두들겨서,때 빼구 말야"
가까이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나는 머리를 돌린다. 무대 옆에 이국인들이 앉아 있다. 순옥이를 보고 웃는다. 손가락 두 개를 세워 보인다. 가무잡잡한 치가 둘, 흑인도 둘이다. 맥주 몇 병을 시켜놓고 앉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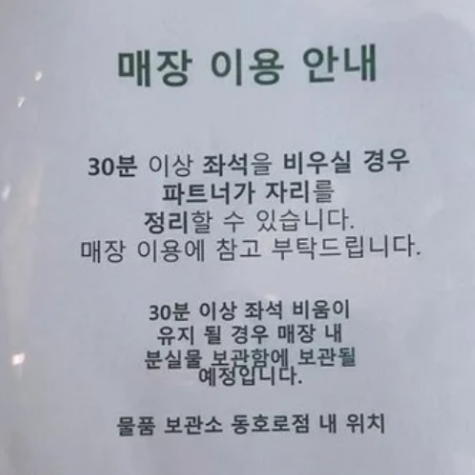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