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양복 윗도리 안주머니를 뒤진다. 돈봉투를 꺼낸다. 채리누나가 할머니 손에 쥐어드리라고 말했다. 나는 할머니 손에 돈봉투를 쥐어준다. 할머니가 봉투를 받는다. 눈을깜박이며 나를 본다. 돈봉투인데, 돈봉투인줄 모르는 눈치다."삼십만원일걸요.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 시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죠. 다달이 적금도 넣고 있답니다. 예금액이 상당해요. 시우가 돈 많이 모아할머니께 드린다고 말했어요"
짱구가 말한다.
"북실댁이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어. 손주가 주는 돈인지 모르는 걸보니" "훌륭한 손주 둬서 할머니 행복하겠어" "시우가 돈을 벌어와 할머니께드리다니. 전자밥통까지 사오구.저런 신형 전자밥통은 싸리골 생기고 처음이야" "노친네가 늦복이 터졌어"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웃음 소리가 만발하다. 박수를 친다. 나는부끄럽다. 밥상 아래라도 숨고 싶다.
한참뒤, 할머니가 비스듬히 눕는다. 도담댁이 얼른 베개를 가져온다. 할머니를 눕힌다. 너무 놀라 피곤하신 모양이라고 한서방이 말한다.그로부터, 동네 사람들은 한참을 더 있다 돌아간다. 그들은 떠나며, 밤도깊었으니 내일 또 얘기를 하자고 말한다. 한서방과 도담댁만 남는다. 한서방은 뒤란의 장작을 옮겨온다. 큰방과 건넌방을 물걸레질해준다."모처럼 집을 찾아왔으니, 시우 너가 할머니와 함께 자지. 친구분도 함께자든가. 건넌방에 여자분이 자면 될테지. 식구들이 덥던 이불로 충분할테니깐"
곽서방이 짱구와 순옥이의 눈치를 보며 말한다.
"싸리골이래야 이제 마을을 통털어 서른명 남짓하지. 시우 너가 있을 적만도 쉰은 넘었잖아. 다 떠났어. 이사간 집도 있구. 젊은이와 애들은 예닐곱도안될 거다. 산골에 못살겠다며 대처로 나갔지. 그러니 여기 사람은 이제 모두 한 가족이다. 너 것 내 것이 없어. 농삿일도 같이 하고, 김치 담가도 나눠 먹고 살지. 네 할머니도 한 식구처럼 동네 사람들이 모시고 산단다"도담댁이 말한다.
"시우, 자네 이젠 아주 여기서 살 거지? 할머니를 자네가 모셔야 해"한서방이 나를 보고 말한다.
"지금은 안됩니다. 종성서 시우가 하는 일이 있으니깐요. 적금 붓는 것도있구요. 추석날 쉬고 그 이튿날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짱구가 나선다. 나는 그냥 아우라지에서 살고 싶다. 이제는 종성시 식구들과 살기 싫다. 그러나 짱구가 나를 놓아주지 않을 터이다. 짱구는 정말 자기말처럼, 한다면 한다. 내가 만약 여기 있겠다면 내 다리조차 긴 칼로 내리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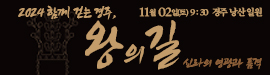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