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지역금융의 특색은 태평양전쟁중이었던 일제말기 몇년을 제외하면 예금보다 대출이 월등히 많은 '오버 론'현상과 식민지배층인 일본인 기업가들에게 자금이 집중대출됐다는 점을 들수있다.
경북지역에 제일은행대구지점(1905년 개점)과 대구농공은행(1906년 설립)본점등 2개금융기관 점포가 있던 1906년말 도내의 예금은 15만8백49원으로 전국(남북한 포함)의 1.1%%, 대출금은 16만7천원으로 1.4%%를 차지했다.
그후 금융기관이 확충되면서 한일 합방직후인 1910년말에는 예금이 68만1천원으로 전국의3.7%%, 대출은 78만3천원으로 3.4%%를 점유하게된다.
도내은행의 예대금 비중이 큰폭 신장되긴했으나 합방전후 한반도는 아직 화폐금융이 맹아기를 벗어나지못한 상황이어서 일반인의 저축에대한 관심은 극히 희박했다. 특히 은행이용의 관습이 낯선 탓에 예대금 계수는 미미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14년 발발한 제1차세계대전중의 세계경제호황에 힘입어 1910년대 후반들어서는 금융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된다. 1915년 1백58만5천원으로 전국의 4.4%%를 차지하던 예금은 5년뒤인 1920년 6백75만5천원으로 4.3배, 1백73만원으로 전국의 3.7%%였던 대출은 무려 11.9%%나 늘어난 2천58만3천원을 기록하게된다.
또 1934년에는 예금 1천5백46만5천원, 대출 3천2백84만4천원에 이르게된다. 이를 은행별로 보면조선은행 예금 2백22만2천원 대출 9백35만5천원, 식산은행 예금 6백25만5천원 대출 1천5백20만2천원, 대구상공은행 예금 4백4만6천원, 대출 3백80만6천원, 한성은행 예금 1백20만7천원 대출 1백56만3천원, 경상합동은행 예금 1백73만5천원 대출 2백91만8천원등으로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다.
1939년 발발한 제2차세계대전은 한반도의 한쪽구석에 있던 경북지역의 금융에도 큰 변화를 몰고왔다. 전쟁을 도발한 일제가 모든 금융정책을 전시금융체제로 전환한 때문. 군수산업에 대한 융자가 중점으로 이뤄지면서 이제까지의 '오버 론'현상이 역전돼 예금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다.1940년 도내 예금은 4천8백11만6천원으로 전국의 4.2%%를 차지했으나 전쟁말기인 1944년말까지1억5천9백12만2천원으로 비약적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대출은 8천6백51만6천원(전국의 4.6%%)에서 1억2천5백48만7천원으로 전국점유비가 1.6%%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전비조달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주어졌음을 보여준다.
일제말기 몇년을 제외한 '오버 론'현상은 당시의 금융기관이 자금공급기관으로 여신업무에 주력하고 금융기관의 경영방침도 예금에 구애받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는 일제하 한반도에는 산업개발자금의 수요가 국내 자본축적속도를 앞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의 산업정책적, 사회정책적기능이 강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제하 금융이 식민지배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이용됐는가는 대출상황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1937년말 대구지역 은행의 대출총액은 4천만원. 이중 일본기업인에게 대출된 것은 2천6백만원으로 65%%를 차지했으나 한국인기업에 대출된 금액은 35%%에 머물렀다.
또 대출을 받은 총6천9백56명중 일본인은 32.9%%, 한국인은 67.1%%였다. 따라서 1인당 대출액은 일본인은 1인당 평균 1만1천4백31원이었으나 한국인은 약 3분의1인 3천19원에 그쳤다. 특히공업자금은 일본인의 대출액이 12배, 상업자금은 5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제하 금융기관은 한국인의 저축과 재원을 동원해 일본기업과 전쟁수행기관에 공급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될수 있다.
〈池國鉉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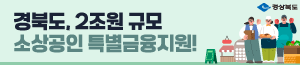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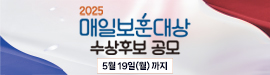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험지 경북' 찾은 이재명 "제가 뭘 그리 잘못을…온갖 모함 당해"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홍준표 "탈당,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잠시 미국 다녀오겠다"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 기구 구성…"한덕수 측과 협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