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땅에 맨 처음 도착했던 청교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두가지를 죄악시했다. 하나는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이다. 이런 청교도들의 의식에서부터 그들은 노동의 신성함을 배웠고,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웠다. 재산을 남기는 것, 그것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르게 투자하고 가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되어 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자녀들도 으레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부(富)의 상속은 우리 사회에 혈통주의만큼이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간혹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할머니들이 전 재산을 학교나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크게 보도되는 이유도 이같은 사례가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나 저금통장 하나 없이 사셨다고 한다. 그 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인 영락겨회를 27년간 담임하고 은퇴한 후, 교회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를 마다하고 남한산성 안에 있는 20평짜리 사택에 기거하시면서 기도와 묵상으로 일관하셨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진 자동차를 탈수 있었는데도 그 분은 바보처럼 좋은 옷 대신에 소매가 닳아빠진 옷을 입었고, 멋진 차 대신 버스를 타거나 남의 차를 빌려 타곤 했다. 그 분은 정말 바보처럼 사셨다. 그러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 심사위원회는 1992년 그분에게 템플턴상을 수여하면서 "한 목사는 아마도 20세기가 낳은 한국의 가장 뛰어난 목사일 것이다"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의 영화에 급급하여 다툼을 일삼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한 성직자의 숭고한 삶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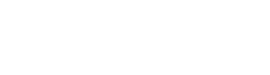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