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사랑을 적나라하게 노래하는 모내기 소리
여름철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가뭄과 홍수이다. 무더위와 장마가 필연적으로 찾아오듯 여름마다 찾아오는 가뭄과 홍수이지만 정부의 대책은 예전과 그리 다르지 않아 해마다 피해를 입곤 한다. 가뭄과 홍수의 되풀이 못지 않게 대통령의 지역편중 인사도 정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역주의를 뿌리뽑겠다고 장담한 대통령 스스로 지역편중 인사를 거듭하다 보니 이틀만에 장관을 경질하는 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총리 제청으로 각료 임명을 해야 하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바람에 이틀 장관, 열흘 장관, 한달 장관이 속출하고 있다.
오죽하면 당내 의원들조차 인사책임론을 들먹이며 청와대 쇄신을 주장했겠는가마는, 대통령부부는 한가롭게 청와대에서 김종필씨 부부를 초청하여 만찬회동을 했단다. 두 김씨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 깊어서 주위의 눈총도 의식되지 않는 모양이다. 모내기판에서도 사랑 노래는 간절하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름답다. 절제의 미덕도 보인다.
산넘어 큰애기 삼을 삼아 이고
총각을 보고 옆걸음 치네
총각을 보고서 옆걸음 쳤나
동남풍 바람에 옆걸음 쳤네
저기야 가느나 저 임은
날 보느라고 길 못 가네
야야 총각아 니 못났네
동남풍 분다고 돌아봤다
길에서 총각을 만난 처녀의 두 가지 반응이 흥미롭다. 총각을 의식하고 옆걸음 치는 처녀나, 총각을 먼발치에서 돌아보며 가는 처녀의 속마음이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동남풍에다 핑계를 대는 데 묘미가 있다. 동남풍은 곧 봄바람이기 때문이다. 이들 노래는 미묘한 사랑의 정서를 은유하는 데 머물고 있다. 그러나 모내기판에서 남녀끼리 노래를 주고받다가 보면 사랑의 감정이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나가는 선보님네/ 꽃을 보고서 그냥 가나
꽃을 보니 곱거마는/ 남의 꽃에다 손을 대리
담장 안에 핀 꽃가지/ 담장 밖으로 늘어졌네
지나가는 선보님이/ 꽃을 보고 길 못 가네
울산 사는 김석보 어른이 모노래를 아주 길게 불렀다. 남녀가 서로 이성을 유혹하고자 하는 대목에 이르렀다. 길가는 선비에게 처녀가 은근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꽃을 보고서 그냥 가느냐'며 말을 건넨다. 선비는 남의 꽃에 손을 댈 수 없다고 거드름을 피운다. 그러나 처녀가 한층 노골적으로 담장 밖에까지 모습을 드러내면 총각의 태도가 달라진다. 총각은 마침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그물 놓자 그물 놓자/ 우물가에다 그물을 놓자
자나 잔 처녀 다 빠지고/ 실한 처녀만 걸려주소
처녀를 유혹하는 총각들은 한층 적극적이다. 아예 처녀들이 아침저녁으로 물 길러오는 우물가에다 유혹의 그물을 놓는다. 작은 처녀는 다 빠지고 실하게 다 큰 처녀만 걸려들길 기대한다. 그러다가 한층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유혹으로 발전한다.머리도 좋고 실한 처녀/ 울뽕남게 걸앉았네
울뽕줄뽕을 내따주마/ 백년가약을 나랑맺자
별당 안에 연당 집에/ 연밥따는 저 큰아가
연밥줄밥을 내 따주마/ 백년가약을 나랑 맺자
울뽕은 울타리에 서 있는 뽕나무다. 처녀가 자기 집 울뽕나무에 올라가 뽕을 따고 있는 것을 보고 길 가던 총각이 수작을 부린다. 뽕나무 가지에 걸터앉아 있는 처녀의 행실이 규수답다기보다는 선머슴아 같다. 총각이 말을 붙여봄직하다. 배짱 좋은 총각들은 길가 수작에 만족하지 않고 규수의 별당까지 접근한다. 별당 안도 이미 바깥채와 격리되어 있는데, 연당 안은 더욱 외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구역이다. 그러나 총각은 범접하기 어려운 연당까지 과감하게 접근해서 당당하게 청혼한다.
상주야 산간 맑은 물에/ 상추 씻는 저 큰아가
겉에 떡잎은 버리고/ 속에 속잎을 나를 주소
선 선부님 그 말말고/ 갈 길이나 재촉을 하소
속에 속잎 골라 씻어/ 드릴 님이 따로 있소
공간적 접근도 연당 안처럼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르지만 눈길의 깊이도 매우 속 깊은 곳까지 미친다. 냇물에 상추 씻는 처녀를 보고 상추의 떡잎은 버리고 '속에 속잎'을 달라고 한다. 상추의 속잎은 여성의 은밀한 곳을 상징한다. 백년가약의 청혼과 다른 성적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처녀가 그냥 듣고 넘길 수 없다. 속잎을 골라 씻어 드릴 님이 따로 있으니 엉뚱한 말말고 가던 길이나 얼른 가라고 한다. 님이 있는 처녀라 당당하게 말 대거리를 하는 셈이다.
'알금삼삼 고운 처녀/ 오며가며 빛만 뵈고/ 대장부 간장 다 녹이네' 예쁜 자태와 싱싱한 몸매를 뽐내며 오고가는 처녀들의 모습이 총각들 보기에 마치 약만 올리는 것 같다. 대장부 간장이 녹아 내릴 만하지 않은가. 그래도 남정네들은 숨통을 틀 짬이 있다.
모시야 적삼 시적삼에 연적 같은 저 젖 봐라
많이 보면 병난다네 쌀내끼 만큼만 보고 가소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함박꽃이 피어나네
그 꽃 한 번 쥘라 하니 호령소리 벽력같소
점심을 이고 오는 여인네들의 봉긋한 젖가슴은 총각들 가슴을 설레게 하기 딱 알맞다. 점심밥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두 손을 올려 잡게 되면 오지랖 밑으로 젖가슴 일부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분통' 같기도 하고 '연적' 같기도 하며 '함박꽃' 같기도 한 젖가슴을 훔쳐본다. 그러나 지나치게 탐닉하면 응큼해진다. '담배씨'만큼이나 '쌀낱'만큼, 또는 '손톱'만큼이나 '눈꼽짹이'만큼만 보라고 한다. 자제력을 잃고 만지려들다간 벽력같은 호령소리를 듣게 마련이다. 이처럼 남녀가 더불어 모내기를 하면서 온갖 사랑노래를 부른다.
여기 꼽고 저게 꼽고 쥔네 마누라 거기 꼽고
꼽기사 꼽았건만 엉산이 져서 아니 컸다
경주 사는 문분조 할머니 소리이다. 모숭기 소리가 갈 데까지 다 갔다. 모를 논에다 심는 행위를 마치 성행위에 견주어 '꼽다' 또는 '꽂다'로 은유한다. 줄모와 달리 벌모를 심을 때에는 여기 저기 모를 마구잡이로 꼽았던가 보다. 마침내 쥔네 마누라 거기까지 꼽았단다. 쥔네 마누라 거기는 '엉산' 곧 그늘이 져서 모가 자라지 않아 결실을 볼 수 없다. 엉뚱한 욕망 때문에 공연한 짓을 한 셈이다.
요즘 정부 인사가 벌모 심듯 한다. 내 편이다 싶으면 여기저기 마구 꽂아댄다. 자질이 되든말든 충성도가 높고 눈에 들기만 하면 벌모 꽂듯 낙하산 인사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뭘 하는 자린지 모른 채 성은을 읊조리며 정권재창출을 맹세하고 거짓말로 둘러대기나 하는 위인을 덜컥 등용을 해서 물의를 빚은 것도 권력안보의 탐욕 탓이다. 더 문제는 인사 사고가 아니라 '충성인사'에 맛을 들인 나머지 젊은 의원들의 '충정'을 '반란'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곧 권력누수를 자초하는 일이자 스스로 제왕적 군주를 자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봉건왕조인 조선조에도 왕정을 비판하는 선비들의 상소가 반란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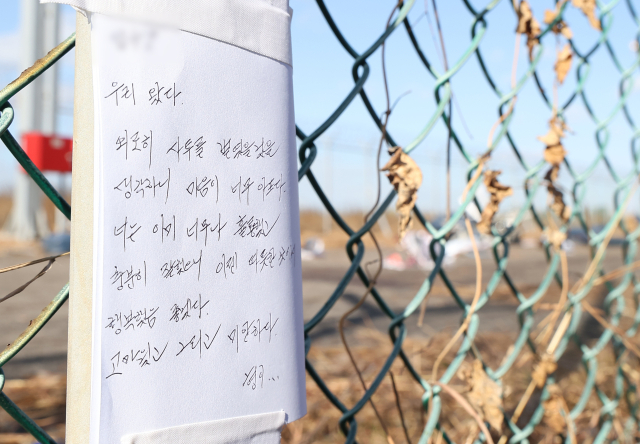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전광훈, 무안공항 참사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발언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