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마조마했던 민주·자민련 연정이 현시점에서는 깨어져 있으며, 정당 정파마다 그 손익계산서 뽑기에 분주하다. 바야흐로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든 셈이다. 그러잖아도 여당의 발목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야당이 이젠 그 허리를 휘어잡은 셈이다. 물론 남의 허리만 잡고 있을 수는 없기에 두 야당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정치적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임 전 장관 해임의 찬반 여부는 구태여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정당정치의 행태에 대해서는 너무 할말이 많다. 언제나 '국민의 소리'에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겸허하게' 귀를 기울인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소리는 고사하고 가장 가까운 '당원의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기에 여념이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임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3당 지도부는 항상 선호해 마지않는 '일사불란'으로 대처했을 뿐 당내의 소수 의견은 철저히 묵살 정도가 아니라 원천봉쇄해 버렸다. 소수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타결점을 찾을 시도도 없이 애시당초 정면 대결하면서 '당론'의 관철에만 여념이 없었다.
덧셈만 할 줄 아는 보통사람이라면 도저히 이렇게 싱겁게 끝장날 게임을 왜 여당은 방치했으며, 연정의 상대였던 자민련은 왜 꼭 그토록 박력있는 추진력을 발휘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가령 여당은 연립정권의 구도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고, 야당 역시 오늘의 정치 판도를 크게 뒤흔들어 보려는 속셈이 깔려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싱거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위를 왜 '정치'라는 이름으로 자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해임건의안의 문맥 그대로 현정부의 햇볕정책 추진 방법론에 대한 불만에서라면 이건 정치인들의 상상력이 너무 빈곤한 게 아닌가 싶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판국에서는 여론의 추세에 의하여 정치권의 기본 구도가 바뀌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째서 모든 정당이 하나같이 지도자 한 사람의 '낙점(落點)'으로 일사천리식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을까. 한 사람의 견해대로 모든 게 결정된다면 정당이나 의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언론은 통상 소속 정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의원에게 '반란표'를 던졌다고 지칭하는데 이런 술어 자체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언술이 아닐까.
입만 있고 귀가 없는 한국 정당사는 불행하게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집합체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뿐 참된 의미에서 의회정치의 윤리의식이 희박한 것 같다. 이념도 국민복지도 아랑곳없이 당면한 정략을 위해 모인 집단이기에 역대 대통령은 거의 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그 정당이 자생력을 잃는 단명의 정당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광복 후 오늘까지의 정당사는 조선시대의 당쟁에서 그리 크게 진화하지 못한 비민주성에 바탕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있을까.
역대 집권당은 통상 당 대표를 낙점하여 일사불란하게 수 십년 동안 정당생활에서 잔뼈가 굵은 텃밭에서 열렬한 환영 속에 입성, 고용 경영인처럼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일정기간 봉사하다가 정처없이 당직을 떠난다. 모든 분야가 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 테크노크라트 시대에 정당 대표만은 신통하게도 임명권자의 권위에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얼굴 마담'을 선호하여 '배후 조종'이 가능하도록 각본을 짜왔다. 이런 정당 체제 아래서 과연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까? 여야 가릴 것 없이 당내 민주화가 없는 개혁은 형식과 구호에만 그칠 것이다. 정당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구조조정도 허울뿐이지 않을까 싶다.
문학평론가·중앙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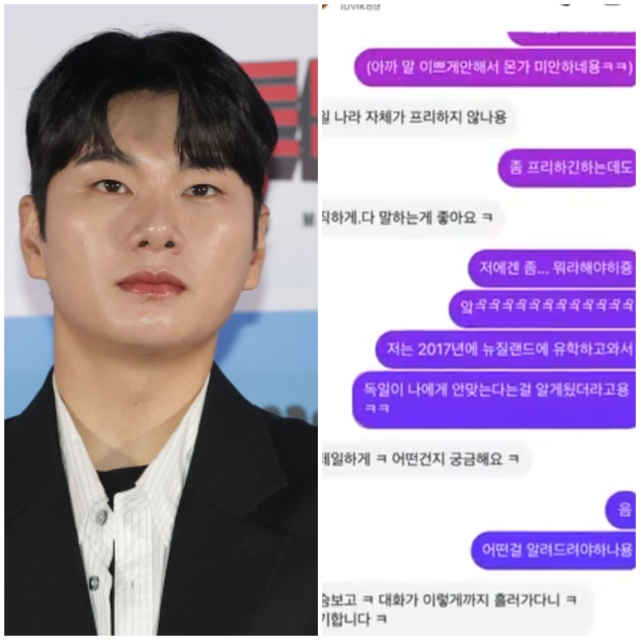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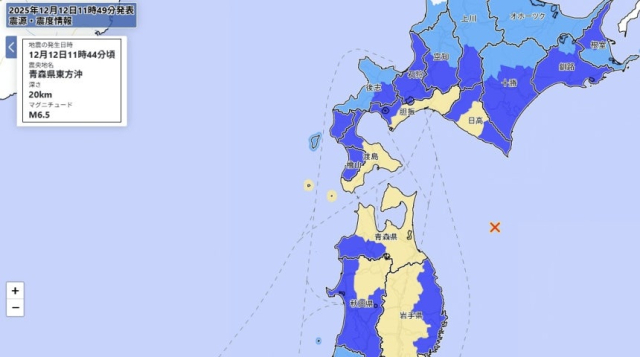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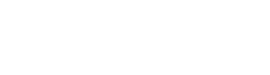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