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非正規職)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노(勞勞)간의 마찰까지 불러오는 요인이 된지 오래다.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올해 임-단협의 노동조건으로 내세울 만큼 쟁점(爭点)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일을 하면서도 임금, 복지와 고용상태 불안정으로 노동현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연구원이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을 보면 정부가 이런 비정규직의 실태개선은 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떨치지 못한다.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대구.경북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0개 국립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인원 124만9천명중 18.8%인 2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 조사했지만 파장을 우려해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는 공개를 미뤄왔었다.
결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폐해 해결에 뒷짐을 진 꼴이다.
이의 단적인 예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실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경우 총원 5천273명중 49.1%인 2천589명이 비정규직이다.
자신의 부(部)상황이 이런 판에 일반기업이나 정부 부처에 비정규직 남용 억제는 거론할 수가 없게 돼있다.
심하게 보면 노동부 스스로가 고용안정성을 외면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상반되는 관계다.
또 기존 근로자 영역침해, 신규채용 인력 창출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양산은 국가 활력에 침해요인이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근로자가 분신자살까지 간 한 원인도 비정규직 차별이 빚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안정망 구축에 고민할 때다.
물론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업에 앞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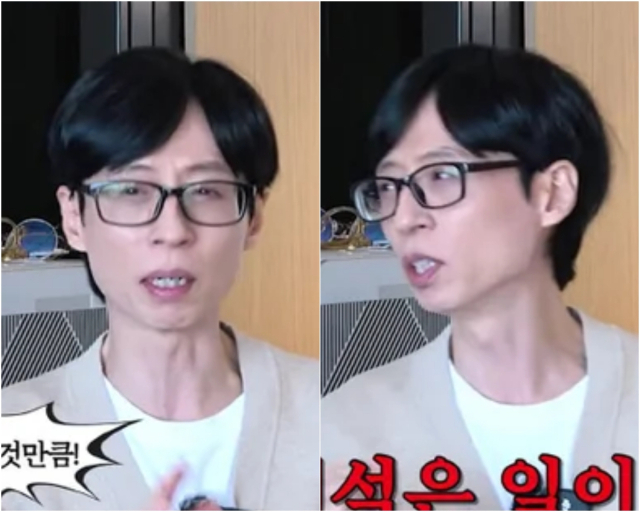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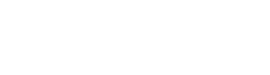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