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백화점 파견 직원으로 일했던 김모(23.여)씨는 '비정규직'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사직했다.
정규직의 60~70%에 불과한 임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견'이라고 불리는 호칭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느껴야 하는 차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김씨는 전표정리와 재정, 매출 등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맡으면서도 연봉 1천100만~1천30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또 비정규직이란 차별의 꼬리표를 항상 달고 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전문대를 같이 졸업한 친구와 함께 응시했다가 성적이 비슷했는데도 친구는 정식 직원이 됐고 나는 면접에서 떨어져 용역업체를 통해 파견 근무하게 됐다"며 "학력이나 성적은 물론 하는 일도 비슷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로 심한 자괴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했다.
파견업체 한 관계자는 "파견된 근로자가 계약기간 2년을 채우는 경우는 20~30%도 채 되지 않는다"며 "대우도 좋지 않은데다 미래도 없다고 느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했다.
비정규직 증가가 청년실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의 몫이 되면서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대학졸업자들이 비정규직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실업자를 선택하는 탓이다.
지난해 대학졸업 뒤 중견기업에서 '인턴'으로 6개월 근무하다 사표를 낸 정모(25.여)씨는 "업체측이 인턴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임금 착취의 목적인 것 같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료정리를 맡았던 정씨는 "다른 혜택없이 매달 9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같이 인턴으로 입사한 동기 중 절반이 6개월이 끝나기전 사표를 냈다"며 "인턴이 사라진 자리에는 또다른 인턴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 취업정보센터 관계자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정규직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어 비정규직을 선택하지만 다음 기회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길 뿐이어서 결국 취업 재수, 삼수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기 일자리가 향후 직장의 특성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조사처럼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도 선뜻 비정규직을 선택하기도 쉽잖은 실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이 지난 2002년도 직장경험 3회 이상인 근로자(15~29세) 5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경우 이후에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첫번째와 두번째 직장 모두 비정규직이었던 노동자가 세번째 직장에서도 비정규직인 경우는 55.3%로 세번째 직장 전체의 비정규직 비율인 23.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게다가 지난해 국내 은행에 입사한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취업 준비생에게 안정된 정규직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수준이다.
노동계에서는 9.1%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이같은 '비정규직 확산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을 예비취업자들이 꺼리는 것도 한 이유라는 것.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철수 정책기획국장은 "실업자가 많을 수록 기업은 양질의 저임금 비정규직을 언제든 마음대로 골라 채용할 수 있어 굳이 정규직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고 이는 다시 청년실업으로 이어진다"며 "정부도 정규.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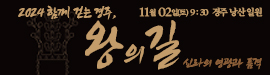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