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요수 인자요산(智者樂水 仁者樂山)'.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통달하여 물과 같이 막힘이 없으므로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의리에 밝고 산과 같이 중후하여 변하지 않으므로 산을 좋아한다는 공자 말씀이다.
굳이 이 말이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산은 오래 전부터 만인의 벗이다.
특히 일상에 찌들고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산은 그 자체가 삶의 활력소이자 청량제다.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도 좋지만 겨우내 삭풍을 이기고 초록으로 변해가는 봄산의 운치도 즐기기 나름이다.
하지만 울진의 봄산은 전쟁터다.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4월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연이어 터진 초대형 산불로 소나무 숲이 초토화하면서 매년 이맘 때면 초비상이다.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산에서 거의 살다시피할 정도다.
울진군청 산림과 김진업 산림보호 담당계장에게 일일 산불 감시원을 자청하고 22일 오전 8시30분 울진군 북면사무소로 갔다.
얼굴을 아는 면사무소 직원들과 선배(?) 감시원들이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동안 사무실 한 쪽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다.
권영호 산업계장이 "지역내 산 정상에 설치해 놓은 무인 감시 카메라에서 보내오는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모니터다.
감시 카메라는 줌 기능이 300배로 면 전역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 산불 감시원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권 계장은 "감시 카메라가 상당 지역을 감시하지만 카메라에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산불은 초기 발견과 진화, 잔불 정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인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전 9시가 되자 모두 면사무소 앞 마당에 집결했다.
산불담당 남세원씨의 인원 점검이 시작되자, 한담을 나누며 느긋하던 감시원들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졌다.
군대 신병처럼 절도가 몸에 배어나온다.
주의사항이 전달될 때는 사뭇 진지한 표정이다.
이윽고 작업복이 주어졌다.
"산불감시원 일이 보기보단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오늘 고생 좀 하이소". 권 계장의 우려와 격려 섞인 인사말로 하루 일과가 시작됐다.
덕구계곡이 있는 응봉산으로 안내됐다.
첫번째 임무는 등산객 입산 통제 업무. 지루함을 느낄 무렵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초소 앞으로 미끄러지듯 달려왔다.
문이 열리고 등산복 차림의 50대 중반의 부부 두 쌍이 내렸다.
다가가 인사를 한 뒤 "산불발생 우려 때문에 다음달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니 양해…". "우리 담배 안 피워. 등산 코스가 좋다길래 그냥 구경 한번 온 거지. 금방 올라갔다 올거요". 풍채 좋은 남자가 기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등산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나머지 세 사람도 그 남자를 뒤따랐다.
다시 입산금지 기간임을 강조했다.
등산객들은 멀리서 왔는데 한 번만 봐달라며 떼를 썼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고가는 말이 더욱 짧아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초소를 지키고 섰던 서정선(56.울진군 북면), 김종식(42)씨까지 가세해 가로막았다.
그래도 등산객은 막무가내다.
실랑이는 한동안 계속됐다.
입이 아플 만큼 설명을 반복하자 이들도 물러섰다.
다음에 오겠다며 주차해둔 차를 향해 서둘러 돌아섰다.
그제서야 한 시름을 덜 수 있었다.
서씨는 "지난 번엔 중앙부처의 한 고위 인사가 신분증까지 내보이며 들어가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이를 제지하느라 혼이 났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남세원씨도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 발생의 절반 수준인 47%에 이른다"며 "우리가 입산자를 통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무에 물이 올라 산불 위험이 줄어드는 5월 중순까지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오전 내내 입산 통제를 놓고 등산객들과 입씨름하며 보냈다.
아내가 싸준 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난 다음 김 계장과 함께 본격적인 산행에 나섰다.
혹시 다른 샛길을 통해 산행에 나선 사람을 돌려보내기 위해서다.
김 계장은 보기보다 날랬다.
평소 체력에는 자신 있었지만 완연한 초여름 날씨에 곧 지치고 말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좀 천천히 가자고 했더니, "낮에는 산불 감시, 밤에는 밀린 업무 때문에 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실 산림 관련 직원들은 요즘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다.
주말은 물론 법정 공휴일도 반납했다고 한다.
산불 위험지역 순찰과 함께 감시원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다.
얼마나 올랐을까. 산은 이미 초록에서 짙푸른 녹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천년 세월을 견딘 아름드리 소나무 원시림이 쭉쭉 뻗은 모습을 자랑한다.
그야말로 장관이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 구천에 뿌리 깊은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소나무의 곧은 기상과 꿋꿋한 기개를 노래한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오우가(五友歌)가 갑자기 떠올랐다.
넋을 놓고 감탄하는 기자에게 김 계장은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다"면서 "짝수 해이면서 총선이나 윤달이 끼인 때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다행히 몰래 산을 오른 등산객은 없었다.
등산을 한 만큼의 시간을 들여 다시 하산을 했다.
군청으로 들어가려는 김 계장을 억지로 끌고 30여분간 차량으로 이동, 대형 산불이 났던 강원도 경계지점의 도화동산을 찾았다.
3년전 취재했던 산불 현장의 복구 상황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산은 키 작은 나무들이 열병식을 하듯 줄지어 심겨 있었다.
산불 피해지에 대대적인 조림사업을 펼친 결과다.
그러나 겉모습은 그런 대로 푸르름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으나 가까이 가 보니 산은 벌거숭이 속살을 그대로 드러냈다.
산불의 상흔은 아직도 곳곳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푸석푸석 날렸다.
타다 만 소나무가 생사의 기로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아직도 그을음 냄새가 진동하는 듯하다.
3년이란 시간도 폐허가 된 산하를 되살리지 못했다.
산불이 나면 지표 온도가 무려 370℃까지 올라간다.
지표면은 물론 땅 속 유기물까지 모두 태워 완전 복구까지 100년이 걸린다는 어느 임학자의 말이 이해가 됐다.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길을 돌렸다.
산을 탈 때 날렵했던 김 계장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거워 보였다.
때마침 불어온 봄 바람이 가냘픈 조림목의 잎을 흔들었다.
드문드문 핀 왕벚나무의 꽃 향기가 코를 간지럽힌다.
타다 만 진달래 그루터기에서도 수줍은 표정으로 꽃망울이 얼굴을 내민다.
끈질긴 생명력이다.
내일은 비라도 흠뻑 내렸으면…. 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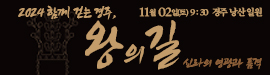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