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행정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여전히 보인다.
일반 국민들도 일본식 한자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적잖다.
1990년대에 정부가 추진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일본식 한자어를 고유어나 우리식 한자어로 고쳐 쓰자는 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써 오던 언어들을 단시간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서인지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수부지(高水敷地)'를 '둔치'로, '노견(路肩)'을 '갓길'로 바꿔 정착시키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의 수에 비한다면 결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가정에서부터 하나씩 일본식 한자어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자녀의 언어 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
흔히 쓰이는 일본식 한자어와 올바른 표현을 소개한다.
▲중차대(重且大)하다(重:무거울 중, 且:또 차, 大:큰 대)='중대하고도 크다'는 뜻인 이 말은 일본어 '쥬우까쯔다이(じゅうかつだい:重且大)'에서 온 말이다.
무게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상황에 따라 '중대(重大)하다', '심각(深刻)하다(深:깊을 심, 刻:새길 각)' 등의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다.
▲공해(公害)(公:공변될 공, 害:해칠 해)='공해'는 글자 그대로 '대중에게 해로운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이 말 역시 일본에서 건너와 퍼진 것이다.
'더러움에 물든다'는 뜻을 가진 우리말 한자어 '오염(汚染)'(汚:더러울 오, 染:물들일 염)으로 바꿔 써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감안(勘案)하다(勘:헤아릴 감, 案:책상 안)=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뜻의 일본식 한자어이다.
'고려(考慮)하다'(考:상고할 고, 慮:생각할 려)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애매(曖昧)하다(曖:가릴 애, 昧:새벽 매)=일본어 '아이마이(あいまい:曖昧)'는 우리말 '모호(模糊)하다'(模:법 모, 糊:풀 호)와 같은 뜻을 지닌 말이다.
이 두 단어가 결합하여 '애매모호'가 된 것이다.
이는 '역전앞'과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모호하다'만으로도 뜻이 충분하다.
▲납득(納得)하다(納:바칠 납, 得:얻을 득)=남의 말이나 행동 따위를 잘 알아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일본식 한자어다.
'이해(理解)하다'(理:다스릴 리, 解:풀 해)로 바꿔 쓸 수 있다.
▲十八番(十:열 십, 八:여덟 팔, 番:차례 번=17세기 무렵 일본 '가부끼' 배우 중 이치가와 단쥬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문에서 내려온 기예 중 크게 성공한 18가지 기예를 정리했는데 이것을 가부끼 18번이라 불렀다.
이 단어는 '애창곡(愛唱曲)', '장기(長技)' 등으로 바꿔 써야 한다.
▲惑星(惑:미혹할 혹, 星:별 성)=혹성은 '유성(遊星)'의 다른 이름으로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천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나 일본식 명칭인 혹성보다 '행성(行星)'이나 '유성(遊星)'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써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장원교육 한자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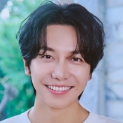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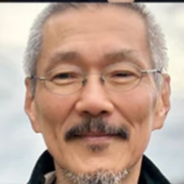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확정…TK 출신 6번째 대통령 되나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민주당도 동의해야"
文 "이재명, 큰 박수로 축하…김경수엔 위로 보낸다"
이재명 "함께 사는 세상 만들 것"…이승만·박정희 등 묘역참배
'국힘 지지층·무당층' 선택은? 김문수 29.2% 홍준표 21.4% 한동훈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