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5시쯤 김모(38·여·대구시 동구 불로동)씨는 두살난 딸을 들쳐업고 근처 성당을 찾았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며 도움을 청한 뒤 기도 방법을 묻고는 기저귀값 1천500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튿날 오전 성당 사회복지위원 구모(52)씨는 김장김치도 전해줄 겸 쌀을 싸들고 김씨 집을 찾아갔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둘째 태식(가명·4)이가 보이지 않자 "아픈 아이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아버지 김모(38)씨는 아무 말 없이 장롱 문을 열어보였다. 얼마나 굶었는지 알 수 없을만치 뼈대만 앙상한 아이가 누워있었다.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에서 죽음을 직감한 구씨는 즉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태식이는 장롱 속에 들어간 지 약 38시간 만에 바깥 세상에 자신의 죽음을 알릴 수 있었다. 이미 지난 16일 밤 10시쯤 태식이는 마지막 숨을 가쁘게 몰아 쉬고 있었다. 밤 늦게 돌아온 부모는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의 머리와 배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휴대용 수지침으로 손가락에 침을 놓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 죽었다고 생각한 부모는 아들을 장롱 속에 눕혀놓았다.
태식이의 죽음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좇고 있는 사회복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김씨 가족의 경우 겉으로는 부모가 젊고 노동력이 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미 오래 전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는 두달 전부터 일거리가 떨어져 수입이 거의 없었고, 어머니마저 정상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를 장롱 속에 넣어두고, 이튿날 막내 딸 기저귀값을 빌리러 간 부모가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느냐"며 "부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정신이상 부모의 문제'로 치부할 사건은 아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어머니 김씨는 아들의 '후천성 성장발육저하'로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질 뿐 결코 정신이상자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김씨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오라는 설명만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병원비도 없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엄두를 못냈던 것.
게다가 하루에 한끼 꼴로 굶은 지가 벌써 몇달 째였지만 주위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 인근 성당에서 지난 2002년 6월부터 숨진 태식이의 분유값으로 매월 3만원씩 지원했지만 그마저 지난 2월부터 중단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차상위계층 조사에도 김씨 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부가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동안 집안 살림은 7살 큰 딸이 챙겨야 했다. 하지만 태식이는 더 큰 도움이 필요했다.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였던 태식이는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7살난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다. 이런 와중에 2살난 막내도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은 오지 않았다.
뒤늦게 동구청은 이들에 대해 차상위계층 지정 및 의료보호증 발급 등 지원책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정에 굶주린 채 싸늘하게 식어간 4살 아이의 죽음을 보상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사진설명 : 태식이가 발견된 장롱의 모습. 태식이는 이 좁은 장롱에서 굶주린채 죽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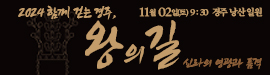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