伯兪有過(백유유과)어늘 其母笞之(기모태지)한데 泣(읍)이어늘 其母曰(기모왈) "他日笞(타일태)에 子未嘗泣(자미상읍)이러니 今泣(금읍)은 何也(하야)오."
對曰(대왈) "兪得罪(유득죄)에 笞常痛(태상통)이러니 今母之力(금모지력)이 不能使痛(불능사통)이라. 是以(시이)로 泣(읍)하노이다."
출전 : 小學(소학)
백유가 잘못이 있거늘 그 어머니가 그를 매질하니 울거늘,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다른 날 매질할 때에는 네가 일찍이 울지 않다가 지금 우는 것은 어째서이냐?"라고 하였다. (백유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兪]가 잘못하였을 때 매가 항상 아프더니, 지금은 어머니의 힘이 능히 저를 아프게 하지 못해 이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孝의 개념이 날로 희미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 위의 글은 진정한 효도와 자식의 도리를 생각하게 한다. 孝라는 글자는 자식이 노인을 부축하여 업고 가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우리는 孝道라고 붙여서 말하지만, 중국에서는 보통 孝順(효순)이라고 쓰고 있다. 효에 대한 생각을 집대성한 책은 '孝經'(효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孔子라고도 하고, 曾子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그 내용은 孝에 대한 다양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儒敎(유교)에 효경이 있다면 佛敎(불교)에는 부모의 은덕이 중함을 열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父母恩重經'(부모은중경)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들어와서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조선 후기 정조대왕은 돌아가신 부모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화가 김홍도의 그림까지 덧붙여서 이 책을 특별히 *刊行(간행)하였다. 주로 어머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어 유교에서 아버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과 *對照(대조)를 이룬다. 漢字成語(한자성어) 가운데서도 효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
예전에 자식들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펴드렸는데, 이것이 昏定(혼정)이다. 저녁[昏]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해 드린다[定]는 뜻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부모님의 밤새 안부를 물었는데, 이것이 晨省(신성)이다. 새벽[晨]에 부모님이 밤새 안녕하셨는지를 살핀다[省]는 뜻이다. 그래서 昏定晨省(혼정신성)은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피고 공경하여 모신다는 뜻이다. 또한 밖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가는 곳을 알리고, 돌아와서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무사히 잘 다녀왔음을 알렸다.
그래야 부모님이 걱정을 덜 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出告反面(출고반면)이다. 이 밖에도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孝'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가 길러 준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르는 말인 反哺之孝(반포지효)가 있다. 또 孝道를 하려고 해도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어 孝道를 할 수 없는 슬픔을 나타낸 風樹之嘆(풍수지탄) 등이 있다.
윗 글에 등장하는 백유는 중국 전한(前漢) 때 사람으로, 성은 한(韓)이고, 이름은 유(兪)이다. 백(伯)은 長男(장남)임을 표시하며,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이 났으며, 보통 한백유(韓伯兪)라고 불렀다. 이 글의 *出典(출전)인 小學은 중국 宋나라의 유자징(劉子澄)이 주희(朱熹)의 가르침을 받아 아동 교육을 위해 지은 책으로 '소학서'(小學書)라고도 한다. 이 책은 어린이에게 일상의 예의 범절과 어른을 섬기고 친구와 사귀는 도리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편은 *經書(경서)를 인용한 *槪論(개론)에 해당하고, 외편은 그 실제를 사람들의 언행으로 보여 주고 있다.
자료제공:장원교육 한자연구팀
▨ 한자 풀이
*笞 (태)매질하다
*嘗 (상)일찍이
*刊行(펴낼 간, 행할 행) : (책 따위를) 인쇄하여 펴냄
*對照(마주볼 대, 비출 조) : 둘 이상의 대상을 맞대어 봄
*出典(날 출, 법 전) : (고사'성어나 인용문 따위의) 출처가 되는 책
*經書(지날 경, 책 서) : 사서오경 따위 유교의 가르침을 적은 서적
*槪論(대개 개, 논할 론) :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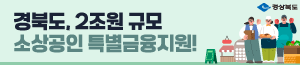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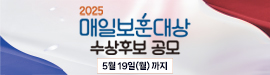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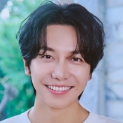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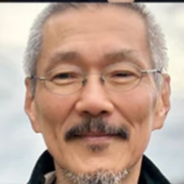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확정…TK 출신 6번째 대통령 되나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민주당도 동의해야"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文 "이재명, 큰 박수로 축하…김경수엔 위로 보낸다"
이재명 "함께 사는 세상 만들 것"…이승만·박정희 등 묘역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