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이 서로 비꾸러지는데는 별 것 아닌 게 원인이 될 때가 많다. 제삼자가 보면 사소한 듯한데도 당사자들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돼"라든가 "죽으면 죽었지" 라며 철천지 원수마냥 등돌려 버리곤 한다.
왕년의 인기 프로 레슬러였던 김일과 장영철. 프로레슬링이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1960년대 당시 장씨가 "레슬링은 쇼다"라고 폭탄선언을 한 후 단절됐던 두 사람이 41년 만에 재회했다. 주변에서 "저 세상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을 만큼 앙금의 골이 깊었던 그들이었다. 항용 그런 앙금은 세월따라 더 두꺼워지고 굳어지기 마련이다. 팔순 가까운 김씨가 휠체어에 의지해 먼 김해까지 병상의 장씨를 찾아감으로써 이루어진 해후는 그래서 감동적이다.
긴 세월을 돌아 이제서야 늙고 병든 몸으로 만난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후배가 먼저 찾지 않는데 내가 왜?"란 생각도 했었다는 김씨. 하지만 섭섭함에 앞서 죽기 전에 오래된 숙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노구를 재촉했으리라. 그 마음그릇이 넉넉해 보인다. 그런 선배에게 장씨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라며 후회어린 화답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아마도 머리에서 가슴까지일 것이다. 머리로는 골백번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 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두 손뼘 길이의 가슴까지 오기가 정말 쉽지 않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움이 너무 오래, 너무 깊어지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진다. 미움을 푸는 데는 사과와 용서,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용서-앙금 하나 남기지 않고 용서하기가 어려운 노릇이다. "용서는 가장 큰 마음의 수행"이라는 법정 스님의 말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나이들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는 법이다. 또 해야 할 일들도 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세븐 업(7up)'이 그 한 예다. 대체로 이런 내용이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라(cheer up), 깨끗하라(clean up), 옷을 신경써서 입으라(dress up), 남에게 베풀어라(give up), 돈 내는 데 미적거리지 마라(pay up), 친구들에게 자주 얼굴을 내밀어라(show up), 말을 적게 하라(shut up).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도 좋을 것 같다. 용서해야 할 땐 화끈하게 용서하라(forgive up).
논설위원 sirius@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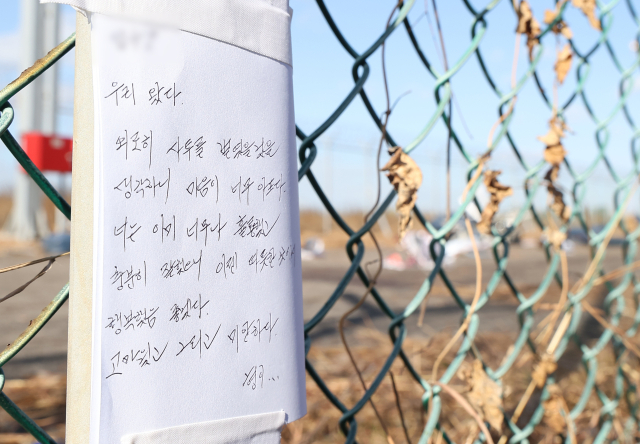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전광훈, 무안공항 참사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발언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