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에게 가장 힘든 일이 기사 작성이라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일이 글 쓰는 직업인데 뭐 그리 엄살이냐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문맥이 물 흐르듯 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기사를 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전문 잡지가 아닌 일간 신문 기사는 최고 인텔리 계층은 물론 겨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생명선과도 같은 마감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한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법관들에게 힘든 일은 무엇일까. 안면이 있는 몇몇 법관들과 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의외의 답변이 '판결문 작성'이란다. 재판해서 있는 사실 갖고 판결문 쓰는 것이 뭐 힘들까 싶지만 달리 생각하면 아주 힘든 작업임에 분명하다.
판결문은 흔히 '법관의 전인격적(全人格的) 표현' 또는 '법관의 분신'으로 표현된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모든 능력을 투입,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 법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국 법관들에게 열람된다. 주요 사건일 경우 법원은 판결 요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들을 잘 이해시켜야 할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인 동료 법관을 포함해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의 준엄한 평가도 기다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판결문 작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자와 마찬가지로 법관도 선고일에 맞춰 판결문을 써야 하는 부담도 막중하게 작용한다. 선고일이 다가오면 머리가 지끈거린다고들 한다.
그러다 보니 판결문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일단 법률용어부터 국민들의 눈에는 아주 난해하다. 법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즉 정확하고 치밀한 법률이론과 법률적 논증을 담는 그릇이라는 생각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다 보니 일반인이 읽기에는 어려운 법률가만의 지적 소통수단이 됐고,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하지만 일부 법관들을 중심으로 판결문을 쉽게 쓰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대구지방법원 이원범 부장판사이다. 그는 "법률 전문가에게는 기본적인 용어라도 일반 국민들에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도가 떨어지며, 일부 용어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판결문의 최종 독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므로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당사자들에게는 생사여탈을 가늠하는 결정적 문서임에도 의미를 이해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모 지법에서는 청구취지를 주문(선고결과)으로 이해해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아닌 국민 편에 서서 쉬운 판결문을 쓰자고 나선 법관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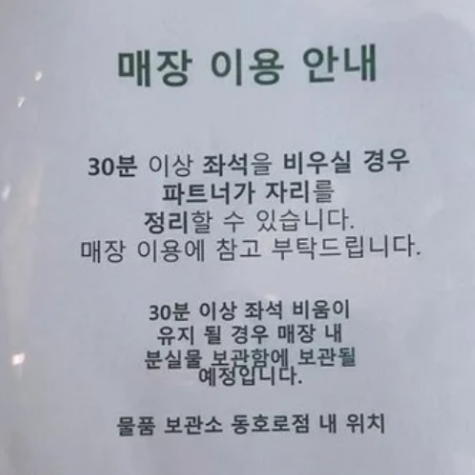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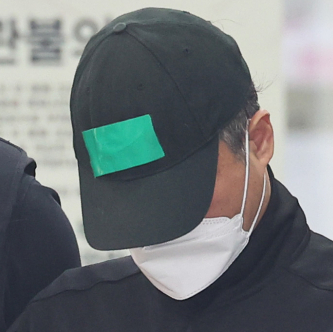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