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훅하고 불자 '후두둑…투툭'하고 동백꽃이 떨어진다. 순식간에 땅바닥이 선연한 핏빛으로 변한다. 동백꽃이 떨어져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 처연하다 못해 눈물이 난다. 동백숲 옆 빽빽이 들어찬 시누대(화살로 사용하던 대나무의 일종)도 바람따라 서걱거리는 소리를 낸다. '청춘의 피꽃'이다. 동백꽃은 한겨울부터 한기가 덜 가신 이른 봄까지 버림받는 것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동백꽃이 무리지어 피어있는 모습은 별로다. 그것보다는 북풍에 혹은 봄바람에 휘둘리며 바닥에 떨어진 모습이 더 낫다.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도 안할 듯 매정한 모습인 듯하다가 훅 어쩌다 불어오는 바람에 뚝뚝 꽃잎이 떨어진다. 절정에 오른 매화나 벚꽃처럼 꽃잎이 날리지도 않는다, 꽃송이가 통째로 날카로운 칼날에 잘린 듯 툭 떨어진다.
그래선가 김용택은 동백꽃을 "여자에게 버림받고 선운사 뒤안에 가서 엉엉 우는 '자존심 센' 사내"처럼 표현했다.
'여자에게 버림받고 살얼음 낀 선운사 도랑물을 맨발로 건너며 발이 아리는 시린 물에 이 악물고 그까짓 사랑 때문에 그까짓 여자 때문에 다시는 울지 말자 다시는 울지 말자 눈물을 감추다가 동백꽃 붉게 터지는 선운사 뒤안에 가서 엉엉 울었다.'(선운사 동백꽃)
선운사 뒷산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동백도 좋고 강진 백련사나 남해 금산도 괜찮다. 이맘때쯤이면 남해안 곳곳에 지천으로 깔린 게 동백이다. 하지만 동백꽃의 '원조'는 여수 오동도다. 동백꽃은 오동도에서 봐야 제맛이 난다. 오동도는 원래 오동나무가 많아서 오동도라 불렸다지만 그 많던 오동나무는 다 어디로 가고 동백섬이 돼버렸다. 팽나무와 소태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돈나무 등 희귀 수목도 곳곳에 숨어있다.
오동도에 아름다운 여인과 어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도적떼가 들어 여인을 겁탈하려하자 쫓기던 여인은 벼랑에 몸을 던져 정조를 지켰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섬 기슭에 무덤을 지었더니 그해 겨울부터 눈 쌓인 무덤가에 동백꽃이 피어났고 곧디곧은 '시누대'까지 솟아났다고 한다. 동백꽃이 곧잘 정절의 상징으로 비유되곤 하는 '여심화(女心花)'의 전설이다.
오동도 곳곳에 산재한 3천여 그루의 동백은 12월부터 3월까지 줄기차게 꽃을 피우고 떨어뜨린다. 동백 가로수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여수에 도착해서 오동도로 향했다. 섬은 768m에 이르는 방파제로 연결돼 있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레탄으로 새로 포장된 방파제길을 걸어가면 봄을 느낄 수 있다. 걷기 싫은 사람은 '동백열차'를 타면 쉽게 섬에 닿는다. 아니면 방파제 초입에 자리 잡은 유람선 선착장에서 운행하는 오동도와 인근 도서를 한꺼번에 돌아볼 수 있는 유람선을 타는 것도 색다르다. 섬은 그리 크지 않다. 3천600평 정도 크기라는데 섬을 가로지르는 산책로(2km)를 따라 걷노라면 한두 시간은 금방이다. 동백꽃잎이 떨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연인들의 모습도 재미있다. 섬 한가운데 자리 잡은 등대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등대에서는 항구도시 여수가 자리잡은 모양새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오동도 앞바다는 2012년 여수국제박람회가 펼쳐질 곳답게 아름답다. 여수는 한려수도해상국립공원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이 새삼 다가온다. 여기서는 또 평지가 좁아 산기슭 위로 점점 올라서다못해 꼭대기까지 집을 짓고 사는 여수사람들의 생활도 엿보인다.
오동도는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다. 전라좌수영 수군의 연병장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임진왜란 때는 화살을 만들기 위해 '시누대' 숲을 늘렸다고도 한다.
돌산도 끝자락에 자리 잡은 향일암으로 향했다. 용 세 마리가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이라는 여수에서 여의주에 해당하는 곳이 돌산대교 옆의 장군도다. 작은 무인도인 장군도는 3월 말쯤이면 섬이 온통 벚꽃으로 뒤덮여 돌산대교와 함께 장관을 이룬다.
향일암에서 보는 해돋이는 장관이다. 그뿐 아니라 양양 낙산사, 남해 금산, 강화 마니산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4대 기도처라고 알려져 있어 연중 수행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신라 고승 원효대사가 수도하며 관음보살을 친견했다는 곳이 바로 이곳 향일암이다. 향일암 뒤편 바위 틈으로 난 산길을 거슬러 올라 관음전에 올랐다. 산 아래로 동백꽃이 언뜻 보이는 것 외에 눈앞에는 다도해는 웬걸,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바다로 향한 '기'를 듬뿍 받았다. 마음이 후련해진다.
향일암의 원래 지명은 영구암(靈龜菴)이었다. 영구암이 자리 잡은 금오산이 거북이 경전을 등에 지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일본을 바라보자'는 뜻으로 향일암으로 이름을 강제로 바꿨다는 역사를 머금고 있다.
돌산대교를 건너서 이곳 향일암까지 들어오는 길은 남해 풍광을 그저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코스 중의 하나다. 섬들이 제멋대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가 좁은 목을 만든 곳, 그곳이 '무술목'(무서운 목)이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선 60여 척을 격파, 왜군들로 '피바다'를 만들어 '피내'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다.
글·사진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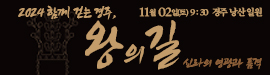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