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黃土재 바라 종일 그대 기다리다,
타는 내 얼굴 여울 아래 가라앉는,
가야금 저무는 가락, 그도 떨고 있고나.
몸으로, 사내 장부가 몸으로 우는 밤은,
부연 들기름불이 지지지 지지지 앓고,
달빛도 사립을 빠진 시름 갈래 만 갈래.
여울 바닥에는 잠 안 자는 조약돌을
날 새면 하나 건져 햇볕에 비쳐 주리라.
가다간 볼에도 대어 눈물 적셔 주리라.
현대시조만 해도 사랑을 노래한 명편들이 적잖은데요. 이 작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구에 회자되는 둘째 수는 특히 절창이지요. 절절하면서도 애틋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곡진한 맛은 언제 읽어도 읽는 이의 가슴을 칩니다.
아마 그대는 황토재를 넘어 오기로 했나 봅니다. 그러나 종일을 두고 기다려도 그대는 오지 않습니다. 타는 얼굴을 여울에 씻어 보지만, 날은 이미 저뭅니다. 여울 바닥의 조약돌에는 지샐 녘의 체념과 미련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것을 건져 햇볕에 비춰 주는 데서 우리네 내림 정서인 哀而不悲(애이불비)의 심사를 엿봅니다.
사내 장부의 하염없는 기다림이 이토록 연연할 수 있다니요. 부연 들기름불과 성긴 사립을 빠져나온 달빛의 대비는 절묘하다 못해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바로 이런 데서 詩眼(시안)의 한 정점이 열립니다.
박기섭(시조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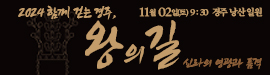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