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 집단 거주지에서 초보적 도시로 발전한 것은 1900년대 초엽의 일이다. 당시 일본인 기록(大邱物語)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2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 서울 인구가 20만에 불과한 시절이었으니 한국에는 도시다운 도시가 하나도 없을 때였다. 그 무렵 대구에서는 얼른 믿기지 않는 일들도 많았다. 위생관념이 없어 시체를 아무데나 버리고, 거리에서 마구 소를 잡았다. 집집마다 대여섯 마리씩 돼지를 키웠는데 대변을 사료로 썼다. 막과자점에서 아편을 팔고, 복통의 특효약으로 설탕이 '애용'됐다. 대구 근교에서 갓 잡은 재두루미 회나 전골이 고급 술 안주로 쓰였다는 내용도 나온다.
그런 촌락 대구가 열차 개통(1905), 시내전화 개통(1906) 등과 함께 근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09년 1월의 순종 황제 대구 1박 순시가 도시건설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황제의 거동은 당시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다. 40채 가마 행렬이 지나갈 길이 없어 하룻밤 새 군대를 동원해 강제로 집을 뜯어내고 길을 뚫었다. 지금의 대안동 선상 도로가 그것이다. 대구 도시정비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100년, 대구는 인구 250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제3의 도시로 올라섰다가 이젠 제4의 도시로 밀리는 형편이다. 오랜 침체로 시민들의 사기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낭보가 날아들었으니 지난 3월 27일의 일이다. 2011년 세계육상대회 개최권을 따낸 것이다. 뭔가 안 되고, 나빠지고, 줄어들고, 가라앉는 도시에 한 줄기 희망을 던지는 것 같았다. 100년 전 초라했던 한 시골도시가 유럽 열강의 중심도시 모스크바를 무너뜨림으로써 김범일 시장은 일시에 대구의 스타로, 행운아로 부각되었다.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 대구를 새로이 폭발시킬 것 같던 유치 성공의 감격은 하루가 다르게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다.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의 98%가 유치를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것은 단 한 번 체육행사를 잘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88올림픽, 부산 아시안게임 등이 보여주듯 도시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부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는 20년 세월 동안 별 볼일 없이 지내던 대구를 이제 재창조해 보자는 각오이기도 하다.
2011년 세계육상대회는 대구를 세계무대에 선보이는 행사다. 챙겨야할 세부 분야들이 너무 많다. 체육시설 및 행사, 육상진흥, 도시개발과 정비, 관광자원 발굴 및 문화행사, 산업 연계, 시민의식 개선 등 일일이 손꼽을 수 없을 정도다. 이에 수반된 대선공약 확보, 정부'정치권의 협조 및 지원, 기업'문화'시민단체의 조직, 대 시도민 홍보와 같은 행정업무도 무수하다. 이런 요소들이 한데 어울려 대회의 성공이 평가되는 것이고, 거기에 세계를 향한 대구의 브랜드 이미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대회 개최까지의 4년 수개월은 결코 충분한 시간이 못 된다. 시간을 금쪽처럼 쪼개 써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마당에 유치 5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동이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략의 부족이거나 무사안일로 비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느슨한 진행을 방관한다면 일과성 행사로 끝날 우려도 없지 않다. 물론 대구시나 관련 기관, 지역 정치권, 기업, 문화단체들이 나름대로 암중모색과 정중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회성공은 시도민의 참여 열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
좋은 일에 우려를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대구시, 구체적으로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열정부족과 아이디어 빈곤을 안타까워해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구의 추락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닫힌 사고와 게으름에 기인하는 바 적지 않다. 뭔가 해 보겠다는 돌파력과 집중력, 근성이 부족해 보인다.
세계대회 유치가 바로 대구 발전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동안의 안일을 벗어던지고 이번만이라도 일답게 해보자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 시가 구심력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육상대회를 대구 완전개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 기회를 대구 발전의 불쏘시개로 만들지 못하면 대구는 100년 전의 시골도시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대구의 미래를 건 흥행이라는 인식이 절실한 때다. 김범일 시장 등 모든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
박진용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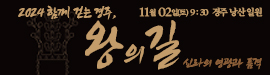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