浮沈
이근배
잠들면 머리맡은 늘 소리 높은 바다
내 꿈은 그 물굽이에 잠겨 들고 떠오르고
날 새면 뭍에서 멀리 떨어진 아아 나는 외로운 섬.
철썩거리는 이 슬픈 시간의 難破
내 영혼은 먼 데 바람으로 밤 새워 울고
눈 뜨면 모두 비어 있는 홀로 뿐인 부침의 날….
저 동해에 가 철썩거리는 파도를 곁에 두고 나직이 읊조림직한 시. 아니, 그 바다 앞에서 속엣것을 다 쏟아내듯 목청껏 울부짖어야 직성이 풀림직한 시.
잠의 머리맡에 '늘 소리 높은 바다'는 어지러운 꿈자리를 말하는 것. 꿈조차 '그 물굽이에 잠겨 들고 떠오르'는, 그야말로 부침의 나날인 것. 또 막상 깨고 나면 한 개 섬이 되어 떠도는, 떠돌다 뭍에서 아득히 멀어지는 '슬픈 시간의 난파'.
꿰맨 상처의 시간들은 철썩거리는 파도에 연방 부서집니다. '먼 데 바람으로 밤 새워 울'어도 '홀로 뿐인 부침의 날'이 파편화한 존재의 상실감을 일깨웁니다. 거듭되는 부침에 더러 물을 먹더라도, 깨어진 조각이나마 움켜쥘 게 있으면 움켜쥐고 가야지요. 존재의 등불을 허투루 꺼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 작품은 율격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정격에선 상당 부분 벗어났지만, 시조로 약속하고 읽어서 거북할 정도는 아니지요. 그게 외려 행간에 의외의 활력을 불어넣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의미의 흐름을 좇는 변화의 율격, 즉 '변격'입니다.
박기섭(시조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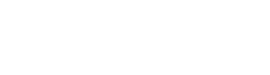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