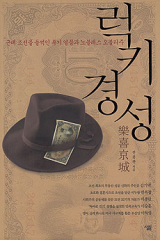
럭키경성(樂喜京城)/ 전봉관 지음/ 살림출판사 펴냄
우리사회 서민들에게 '투기'라는 말만큼 저주스런 것을 찾기 어렵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의 운명이 '부동산 투기의혹'과 투자회사 'BBK 사기 연루 의혹'의 향방에 달려있을 정도다.
"나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돈 있고, 힘(=정보)이 있었으면 투자(?) 해서 크게 한몫 챙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뼈 빠지게 일하고 절약하며 살지만 돈 없고 힘 없어 처량한 이 신세를 평생 못 면할 것 같다. 투기로 치부한 부자들이 너무 싫다. 그들이 돈에다 권력까지 갖는 것은 더욱 싫다." 아마 서민 대다수의 심정이 이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 투기의 기원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을까. 얼핏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고도성장 시대의 부작용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이 '투기'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근대 조선의 '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대 조선인들은 자본주의 '돈맛'을 본 첫 세대였다. 개인이나 사회나 돈 욕심을 어떻게 추슬러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더구나 권력의 중심부에서 배제된 식민지 시대였던 탓에 근대 조선인들의 욕망은 더욱 돈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람들은 금광, 미두(=일종의 쌀 투기), 주식, 부동산, 정어리(= 어유를 정제 추출한 글리세린이 다이너마이트,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돼 각광을 받았다) 등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
예나 지금이나 대규모 개발에는 항상 투기수요가 따르기 마련이다. 1932년 여름 길회선 종단항이 나진에 건설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자 전 조선이 들끓었다. 식민지 조선의 최대 물류항구가 될 나진은 계획대로라면 인구 100만 명의 다롄보다 더 크고 부유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땅 투기꾼들은 구름처럼 나진으로 몰려들었고, '땅!''돈!' 소리가 거리를 메웠다. "웅진에 가면 팁도 100원짜리 지폐로 내고, 개도 1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당시 100원은 평범한 월급쟁이 두 달치 봉급이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벼락부자가 된 투기꾼의 이야기가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반면에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려왔다. 종단항 발표 전 판 땅이 노른자위 중의 노른자위 땅이 된 것을 안타까워하다 실성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 땅을 팔고 평생 상상도 못한 큰 돈을 쥐고 정신을 놓은 사람도 있었다.
또 종단항 유치에 실패한 청진은 대규모 혼란에 빠졌다. 청진에 대규모 투기를 한 투기꾼이 "종단항, 종단항"을 연거푸 부르며 죽음을 맞기도 했고, 주민들의 궐기대회가 이어졌다.
조선 최대의 부동산 투기로 조선 제일의 땅 부자에 오른 김기덕, 미두 판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간 반복창, 주식투기와 정어리 사업 및 금광개발에 뛰어든 전직 사회주의 인텔리 소설가 김기진 등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그러나 이때도 돈에 대한 맹목적 추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조를 이어오던 옹골진 기개도 남아있었다. 북한 애국열사릉에 묻힌 유일한 자본가 이종만, '똑바로 걷기' 경영을 실천한 민족교육가 이승훈, 조선 최초 여성 사회장(社會葬)의 주인공 백선행 등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근대 조선 '돈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무슨 꿈을 꾸었을까? 그들은 오늘날 우리와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같을까? 평범한 우리들의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만나보자. 344쪽, 1만2천 원.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