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도 생명이 있다. 흥망성쇠를 한다. 외적의 침입이나 정권의 찬탈로 운명이 바뀌는 국가와 달리 도시는 내외부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한 때의 영광을 뒤로한 채 사그라지거나 부흥의 전기를 맞아 찬란한 도시 문명을 꽃 피우기도 한다. 일본의 나고야와 미국의 버펄로는 급변하는 대구의 안팎 사정을 볼 때 번영의 탄탄대로와 쇠락의 내리막길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다.
?■ 나고야의 부활
일본의 3대 도시지만 인구면(220만명)에서는 4대 도시라는 점은 대구와 사뭇 닮았다. 게다가 대도시임에도 전통과 관습이 남아있고,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닮은 꼴이 많다. 아울러 인간 관계의 믿음을 중시하는 향토주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끈끈한(?) 상호관계를 유지시키며, 금융 중심의 도쿄나 물류 중심의 오사카와는 다른 제조업 중심의 발달을 이뤄낸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 경제권은 규모로 볼 때 흔히 도쿄권-오사카권-나고야권을 순서로 꼽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며 일본경제신문에서 소개하는 경제권 표기 중 40% 이상이 도쿄권-나고야권-오사카권으로 바뀌었다. 인구는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에 이어 4위이고 경제권은 2, 3위를 다투고 있지만 한 때 나고야도 '통과도시'에 머물렀다. 교토에서 일본 중부를 가로질러 도쿄로 이어지는 고속철 신칸센 '조미호'가 개설될 당시, 일부 열차편은 나고야를 그냥 통과했다. '패션은 도쿄에서 곧바로 고베나 후쿠오카로 간다'거나 '외국 유명 공연은 나고야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았다. 현재의 대구를 거울에 비춰보듯 나고야 역시 그런 전철을 밟고 있었다.
하지만 나고야는 지금 일본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인구는 나고야권이 오사카권의 절반을 조금 넘지만, 1인당 실질 GDP는 오사카를 훨씬 웃돌고, 지난 2003년 일본 전체 무역 흑자 90여조원의 70%가량을 나고야에서 이끌어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거대 기업 도요타가 있다. 하지만 도요타 외에도 건실한 벤처기업들이 나고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2월 개항한 중부국제공항은 나고야 발전의 심장이 됐고, 그해 3월 개막한 아이치 엑스포는 나고야를 세계에 알리는 토대가 됐다. 1988년 올림픽 개최를 두고 막판까지 경합하던 곳이 바로 나고야였다. 그 패배로 충격에 빠진 나고야 시민들은 절치부심했고, 약 20년 뒤 21세기 최초의 세계엑스포를 이끌어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유치했고, 동남권 신공항을 염원하는 대구로서는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 버펄로의 몰락
미국 하버드대 도시경제학자인 글레이서(Edward L Glaeser) 교수는 '시티 저널(City Journal)' 2007년 가을호에 '버펄로는 과연 돌아올 것인가?'라는 글을 기고했다. 한반도 대운하에 기대를 걸고 있는 대구로서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있다.
버펄로(Buffalo)는 뉴욕주 북부에 있는 도시다. 미국 대공황이 시작되던 1930년대 초반 버펄로시의 인구는 57만3천명을 헤아렸다. 미국내 13번째로 큰 도시였다. 하지만 75년이 흐른 현재 이 거대도시는 인구의 55%를 잃었다. 현재 주민 중 27%는 빈곤층이다.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중산층 가정의 연간수입은 3만3천달러로 미국 평균 5만5천달러의 60%에도 못미친다.
버펄로는 운하로 성장한 대표적 도시다. 오대호와 뉴욕의 허드슨강을 연결하는 이리(Erie)운하가 개통(1827년)되기 전, 버펄로 인구는 2천5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운하가 뚫리면서 곡물 유통회사가 잇따라 들어서고, 나이아가라폭포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전기 덕분에 제철회사 등 중공업까지 가세하면서 도시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1950년대 버펄로는 초기 인구의 무려 232배인 58만명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도시의 운명은 여기까지였다. 도로와 철도가 뚫리며 운송비용이 점차 낮아지자 운하의 매력은 떨어졌다. 송전설비가 발달하면서 굳이 기업들은 나이아가라 폭포 곁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혹한의 도시 버펄로는 버려지기 시작했다.
빈곤은 빈곤을 가속화한다. 도심 인구가 떠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집값이 떨어졌다. 전국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됐다. 중산층이 떠난 자리를 빈곤층이 대신했다. 연방정부는 도시를 살리겠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주택을 건설했지만 오히려 과잉 공급은 집값만 더 떨어뜨렸고, 빈곤층 유입의 촉발제만 되고 말았다. 1985년에는 무려 5억달러를 들여 도시철도 시스템도 갖췄다. 하지만 그 넓은 고속도로와 주차장을 내버려두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다. 10년 이상 철도 이용객은 줄기만 했다.
글레이서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곳에 사람들이 머물도록 꼬드겨서는 안 된다. 도시 개발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투자를 해야 한다. 교육이야말로 빈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다. 아울러 버펄로가 부흥한다면 주요인은 정부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간 투자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과거 '빛의 도시'의 영광을 되돌려놓지는 못할 것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버펄로가 작지만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크기는 줄이되 효율은 높이는 것이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 대구 '맑음'이 없다…8개도시 경쟁력 비교
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은 대구와 함께 국내 6개 도시, 일본과 중국 주요도시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교통물류체계, 정주환경(교육 및 주거), 산업, R&D기반(인적자원) 등으로 나눠 본 도시 경쟁력에서 대구는 현재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항과 항만이 없는 대구는 교통물류에서 '조금 흐림'으로 나타났고, 산업 역시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조금 흐림'으로 분류됐다.
반면 부산, 인천, 울산 등은 교통물류 및 R&D 기반 등에서 '맑음'을 나타냈고, 특히 글로벌시대를 맞아 동아시아 경쟁도시로 떠오른 상하이, 오사카, 나고야 등은 전반적인 경쟁력이 '맑음'을 보였다. 대구와 닮은꼴 도시로 평가받는 일본 나고야는 4개 영역 중 3개에서 '맑음'을 보였고, 정주환경에서만 오사카에 비해 교육여건이 다소 취약하다는 이유로 '흐림'을 받았다. 특히 대구는 4개 영역 중 단 한 곳에서도 '맑음' 평가를 받지 못했다.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도시사회연구실장은 "도시 경쟁력은 글로벌화에 어울리는 교통물류체계와 인적자원 공급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에 바탕을 두었다기보다는 현재 도시 여건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도시 간 경쟁력 비교 자료로 봐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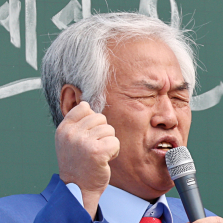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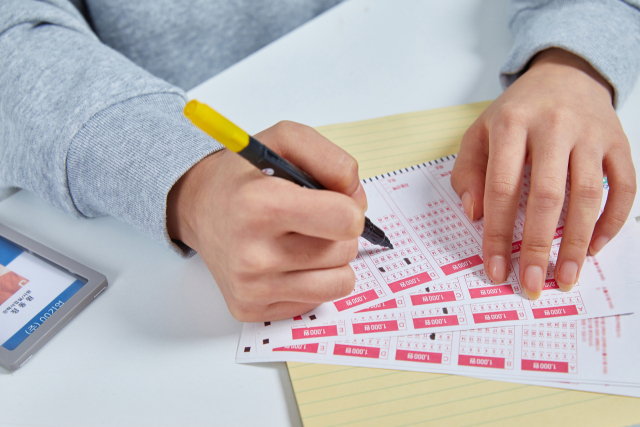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확정…TK 출신 6번째 대통령 되나
'고향 까마귀' 이재명, TK민심 흔드나…민주, 25% 이상 득표 기대
이재명 "함께 사는 세상 만들 것"…이승만·박정희 등 묘역참배
안철수 "한덕수는 출마 포기, 김문수·한동훈은 결단해야"
TK 향한 대형 신규 사업 나올까…李, 공약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