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전, 어머니는 시장에서 떡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었다. 평상시에는 송편, 쑥떡, 인절미 등과 부추전, 파전 등의 간단한 요깃거리로 시장에 장 보러 온 아줌마들의 입을 즐겁게 해 주셨다. 어머니가 만드는 떡은 시장에서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갓 지은 고두밥을 커다란 돌 호박에 넣고 해머 같은 나무 절구로 찧어 만들어내니 맛이 없을 수가 없었다. 문제는 추석이었다. 평상시에는 하루 팔 분량 만큼만 만들면 되었지만 추석이 되면 송편만 한 가마니 가량 만들어야했다. 지금이야 기계로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크기의 송편을 찍어내듯 만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손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이 송편이었다. 추석 전날은 우리 식구는 물론 큰집 언니 오빠까지 밤이 맞도록 송편을 만들어야했다.
모양도 가지가지고 크기도 가지가지였지만 찜통에 솔잎을 깔고 쪄내 참기름을 살짝 발라 놓은 그 송편의 맛과 지금의 기계 송편의 맛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머니는 추석날 아침이면 주문 받은 송편을 다 주인들에게 안기고 큰집에 늦지 않게 도착했었다. 그때는 밤이 새도록 송편을 만드는 것도 싫었고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도 보기 싫었지만 지금은 그 시절 언니 오빠와 즐겁게 만들던 송편의 맛이 그리워진다.
지금은 명절이 돼도 만날 수 없는 사촌언니 오빠들 가정에 보름달 같은 풍성함이 넘치길 마음으로 기원해본다.
정옥연(대구 동구 신천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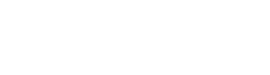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