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들어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있다. 나이를 타는 모양이다. 옛날 것을 늘 그리워하면서도 가끔 새로운 것에 관심이 가는 것은 무슨 주책일까. 시골에서 자란지라 두엄내 같은 서정이 아직도 내 몸 속에 녹아 흐르고 있다는 말인가. 산업화된 사회에서 농경사회를 향수해서 무엇 하겠나만 삶을 꾸려가는 방식이야 달라도 인간의 타고난 성정이야 변할까?
며칠 있으면 추석이다. 이맘때면 도시로 돈 벌러 나간 누나를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서 기다리며 공기놀이를 지겹게 하던 유년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한다. 지금은 공부하러 떠난 고만한 나이의 딸아이를 둔 아비로 추석을 맞이하는 감회를 노래한 김영랑의 시를 읊고 있지만. 시 속의 '누이'는 내 정겨운 누나의 모습이다.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 붉은 감잎 날라와
누이는 놀란듯이 치어다 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다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것네.
'누이'는 장광에도 잘 올라가는, 감잎 하나 날려도 얼굴 붉히는, 그 힘든 추석을 한없이 기다리는, 비바람에 농사 망칠까 걱정하는, 동생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누이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딸들은 어떠한가? 의자 위에도 못 올라가는 겁쟁이, 감잎 수십 장이 날려도 귀찮은 듯 고개 돌리는, 추석이면 일하기가 겁난다며 이 핑계 저 핑계로 여행 떠나는, 농사야 망치든 말든 자기 옷에만 신경 쓰는, 오히려 동생에게 득을 보려는 딸은 아닐까.
'누이'의 삶과 '누이' 또래일 우리 딸들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 '오매! 단풍 들것네'라고만 해도 시 속의 누이는 얼굴이 붉어지는 감성이 풍부한 처녀이다. 경상도식으로, '아이고야꼬! 단풍들라칸다 그제?' 하였을 때 '우야꼬! 정말이대이' 하는 화답은커녕 대꾸조차 하지 않는 딸들과는 사뭇 다르다. 개성도 좋고 서구적 최신 문물도 좋지만 아름답고 풍부한 감성을 길러가는 것이 요구되는 오늘이다. 우리 딸은, 작은 변화에도 가슴 졸이며 수줍음과 두려움으로 조신하게 행동하는 알뜰한 딸이기를 바란다.
시 속의 '누이'처럼 되어 달라고는 하지 않는다. 메마른 감정의 불순물을 걷어내고 맑고 밝은 누이로 자라 주었으면 한다. 여성은 여성다울 때 아름답다.
공영구(시인·경신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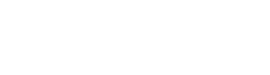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