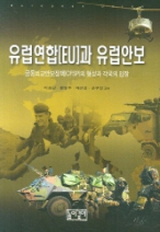
북한이 사정거리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어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말처럼 탑재되는 것이 인공위성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핵탄두가 탑재된다면 그야말로 지구를 공멸시킬 핵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K-2 비행장에서 전투기 출격 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냥 안심할 수만도 없습니다. 주변국 일본은 이미 만반의 대응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요격할 수 있도록 준비 명령을 하달했고, 발사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 수뇌부와 빈번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북한에 대화를 종용하면서 클린턴식 해법을 사용할 것이냐, 부시식 해법을 사용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 양국은 미사일방어구상(MD), G20을 통한 공조,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 6자회담을 통한 협조 등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가장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상의할 대상도 없다는 점입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외줄에 매달리고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그루지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그루지야를 대신해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결국 충분한 자구력을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다양한 생존 방안들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승근 교수와 몇 분의 학자가 공동 집필한 '유럽연합(EU)과 유럽 안보'(높이깊이, 2007)를 보면 한국의 생존 묘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냉전 종식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통해 안보 질서를 확립한 유럽의 경험을 한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유럽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근대 이후 모든 전쟁의 시발점이자 중심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에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에 편입되어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대치해야 했습니다. 1954년 처음으로 독자적인 안보 체제인 '유럽방위공동체'(EDC)를 구상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냉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주도의 안보 우산을 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유럽이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기점으로 달라졌습니다. EU를 결성하면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저자들이 주목한 것은 유럽인들의 안보 인식입니다. 안보에 대한 회원국 국민들의 인식이 유럽이 독자안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분석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 EU 회원 국가의 성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EU 회원국 국민들의 안보 관련 입장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EU내의 공동 안보를 위해서 미국을 중심축으로 해야 한다는 '대서양주의'(Atlanticism), 순수 유럽인들이 EU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유럽주의'(Europeanism), 그리고 '제3그룹'입니다. 대서양주의는 영국과 덴마크가 중심이 되고 스페인과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국가군들이 따르고 있으며, 유럽주의는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3그룹은 유럽의 소국과 중립국인 룩셈부르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와 2004년 EU에 새로 가입한 동구권 국가와 지중해 국가들입니다. 이처럼 EU 회원국 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유럽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로 응답자 대부분이 EU 발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빠른 시간 내에 유럽은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인에 의한 유럽 안보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