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과 인간은 시간의 궤(軌)를 달리한다. 사람은 유한성에 갇혀 있고 자연은 인간보다 시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문경에 오면 그 간극을 조금 줄여볼 수 있다. 새재를 따라 '대조영'부터 '태조왕건' '대왕세종'까지 드라마 세트장이 이어져 천년의 역사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초가의 정겨운 곡선부터 궁궐 용마루의 화려한 추녀선이 뒷산 풍광과 잘 어우러져 시공(時空)을 혼돈케 한다. 이런 산 밑에서의 소란(?)을 말없이 내려다본 산이 있으니 바로 조령산이다. 이 산에 오르면 '600년 소회'를 들어볼 수 있으려나.
백두대간을 경유하는 대표적인 고개는 단양의 죽령, 문경의 조령, 영동의 추풍령을 든다. 그 중 조령은 조선시대 영남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대표적 관문이었다. 평화시에는 교통, 물류의 요지였고 전시(戰時)엔 험난한 지세를 방패삼아 군사적 요충지로 기능했다. 이 새재를 허리춤에 앉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산이 조령산이다. 지근거리에 신선봉, 마역봉을 끼고 있고 북쪽으로 월악산, 문수봉, 소백산을 남쪽으로는 속리산까지 지맥을 펼치고 있다.
◆평화시엔 문물교류 전시엔 군사기지=오늘 산행의 출발지는 이화령. 일제 강점기 때 건설된 이 고개는 조령과 함께 경북과 내륙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이화령 코스의 장점은 넉넉한 식수. 등산로 초입에 조령샘과 끝 지점에 조령약수가 있어 배낭무게를 줄일 수 있다. 이화령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일행은 정상을 향해 스틱을 내딛는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삼복더위지만 숲이 울창해 햇빛걱정은 덜었다. 여름 산에 야생화가 곳곳에 군락을 이루었다. 특히 근심을 잊게 하는 풀이라는 원추리의 유혹이 가장 강렬하다. 초록일색의 숲길에 노랑의 노출 강도는 아찔할 정도. 이게 바로 보색의 효과일 터.
40분쯤 올랐을까 멀리서 멋진 잣나무 숲을 배경으로 조령샘이 나타났다. 가물어도 사철 마르는 법이 없다 하여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산신령의 선물'로 통한다. 누군가 적어 놓은 시구 하나가 물맛을 더해준다.
'사랑하나 풀어 던진 샘물에/ 바람으로 일렁이는 넋두리가/ 한 가닥 그리움으로 솟아나네'
누굴까 한 모금 샘물에 사랑과 그리움을 투영시킨 이는.
솔직히 조령산은 문경새재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진다. 혹자는 산이 재(嶺)에 묻어간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산꾼들은 새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조령 위주로 편중돼 조령산을 간과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화령~제3관문~마역봉~신선봉 코스는 설악산의 공룡능선과 견줄 만하다고 말한다.
이화령을 출발한 지 1시간, '백두대간 조령산'이라고 쓴 표지석이 일행을 맞는다. 조령산은 사방으로 트인 조망이 백미다. 동쪽으로 주흘산이 병풍처럼 펼쳐 있고 대간의 하늘금 중 열손가락 안에 든다는 부봉, 그 너머엔 월악산이 부드러운 산너울을 자랑하고 있다. 동북쪽으로 펼쳐진 산군(山群)들의 원경을 감상하며 신선암봉 쪽으로 진행한다.
◆주흘산'월악산'부봉'''탁트인 조망 일품=깃대봉~제3관문 쪽으로 진행하면서 복병이 나타났다. 산이 경사의 변화가 심하고 암봉과 암릉이 많아 로프구간이 수도 없이 나타난다. 로프로 오르내리길 20여차례. 드디어 신선암봉에 이르렀다. 신선암봉은 조령의 중앙에 위치해 최고의 조망 포인트. 사방으로 트인 조망과 함께 직벽으로 흘러내린 대슬랩이 압권이다. 벼랑 사이에서 바위들의 기묘한 배치와 노송의 조화가 화폭을 이루었다. 서쪽으로 자리 잡은 공기돌바위도 재미있다. 집채만한 크기의 둥그런 바위가 경사면에 위태롭게 걸려 있어 금방이라도 데구르르 굴러갈 것만 같다. 신선암봉에서 깃대봉까지는 시오리길이 넘는 능선이다. 로프와 씨름하기를 1시간여. 깃대봉의 노송들이 풍경화 모드에서 정밀화 모드로 바뀌어 있다.
깃대봉에서 야생 염소와 맞닥뜨렸다. 뿔이 등쪽으로 휘감긴 것을 보고 처음엔 산양인 줄 알았는데 일행 중 한분이 산 밑 농가에서 염소의 귀소성을 이용해 방목을 많이 한다고 일러주었다. 낯선 산꾼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일행에게 방을 빼주고는 자리를 뜬다.
비탈길에서 지친 다리가 평지를 갈망할 때쯤 드디어 산행 종점인 3관문이 나타났다. 용장 신립(申砬)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든 현장이다. 그는 자신의 정예 기병을 믿었다. 기마(騎馬)의 전력이 극대화되는 곳은 탄금대라고 믿었고 새재를 버렸다. 결과는 국운을 기울게 했다.
이런 역사의 비운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조령관 한 쪽엔 조령약수가 쉴 새 없이 물을 뿜어내고 있다. 마시면 장수한다고 이름도 백수영천(白壽靈泉)로 불린다. 이제 하산길. 일행은 옛 과거길로 접어들었다. 옅은 졸음 속에서 괴나리봇짐을 맨 선비, 문서 두루마리를 든 아전, 옹기를 가득 실은 우마차가 지나간다. 느닷없는 할머니의 야단소리에 정신이 퍼뜩 돌아온다.
"애꿎은 나뭇가지를 뿐질면 워쩐댜~." 재 하나 넘었을 뿐인데 말투가 바뀌어 있었다.
글'사진 한상갑기자 arira6@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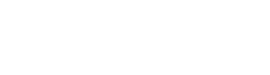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