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단풍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예쁜 단풍잎을 주워 책갈피에 꽂아두고 로맨틱한 감상에 젖는 이들이 많다. 세월이 흐른 뒤 우연히 책갈피에 꽂아둔 단풍잎을 발견하고는 탄성을 지른 경험도 있을 것이다. 단풍잎이 바스러졌어도 선명한 빛깔만은 그대로 남아 아스라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노년에는 단풍을 보면 회한과 쓸쓸함을 느낀다고 한다. 단풍은 잎이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자연현상이기에 사람으로 치면 회광반조(回光返照)와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단풍에 대한 낭만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조선시대에는 집에 단풍나무를 아예 심지 않았다. 지조 없이 울긋불긋하게 색깔을 바꾼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은행나무는 집에 심었다. 녹색 잎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은 그다지 큰 허물로 보지 않은 것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단풍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 나무가 벌이는 생존 투쟁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나무가 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 단풍을 생기게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아직까지 정설은 없다. 나무가 에너지 비축이 필요한 겨울을 앞두고 쓸데없이 별도의 색소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이론이 분분하다.
지난해 영국 임페리얼대 연구진은 '붉은 단풍은 나뭇잎을 갉아먹는 해충을 물리치기 위한 방어용'이라는 학설을 내놓았다. 나뭇잎에서 수액을 뽑아먹고 사는 진딧물의 경우 붉은색보다는 노란색, 녹색의 나뭇잎을 훨씬 좋아한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증명됐다는 것이다. 해충 때문에 인간이 단풍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결론은 좀 코믹스럽다. 또 뉴욕 콜게이트대 연구진은 '단풍의 붉은색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종족을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독(毒)이자 방어막'이라는 학설을 제시했다. 붉은 단풍잎이 떨어지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다른 수종이 주변에 자라지 못하도록 독을 분비한다는 것이다.
산과 들에는 녹색의 나뭇잎이 조금씩 색깔을 바꿔 입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단풍 시기는 중부지방과 지리산에선 10월 1~20일, 대구경북에선 10월 20일~11월 5일로 예상된다. 올해는 풍부한 일조량 때문에 단풍 색깔이 그 어느 때보다 곱다고 한다. 단풍에 물든 추억 하나 남기는 것도 좋겠다.
박병선 논설위원 lala@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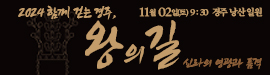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