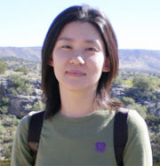
허진호 감독의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상우는 은수에게 말한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 영화를 볼 당시 나는 20대였다. 그때 나는 순수남의 순정을 배신한 은수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속물. 은수는 내게 그런 여자였다.
이제 내 나이 서른하고도 다섯을 훌쩍 넘긴 나이. 서른보다 마흔이 더 가까운 나이에 나는 다시 그 영화를 본다. 사랑이 현실임을 몸으로 깨달은 여자에게 남자의 그 말은 참 난감하다. 그렇다. 사랑의 열정이 지나간 자리엔 여지없이 현실이 남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현실을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처럼 받아들인다. 사랑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다.
지금 만약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다.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아닐까 하고. 아마도 그 과정은 '사랑이 식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큼 많은 변화를 동반할 것이다. 더 이상 그 여자의 투정이 예뻐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그 남자의 호기가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사랑의 끝을 증명하는 거라 여긴다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랑은 과정이다. 서로의 장점이 단점처럼 여겨지고 더는 가슴 뛰는 순간이 없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일상을 든든하게 지탱해준다. 밉다, 싫다 해도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기쁠 때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려면 사랑의 방식을 보라는 말이 있다. 가슴 뛰던 순간이 지나가고, 덤덤해진 순간이 왔다고 해도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의 삶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지겹고 때론 벗어나고 싶은 일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며 살 수 있으리라.
다시 봄이다. 또 꽃이 필 것이다. 내 인생에도 사랑이 피고, 또 일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지겨워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듯 사랑 역시 변한다는 걸 말이다.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다른 것처럼, 피부에 닿는 바람의 질감이 순간순간 바뀌는 것처럼 사랑도 변한다는 걸 말이다. 변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이제 나는 인정한다. 그것이 '싫어졌음'의 뜻이 아니라 사랑의 과정임을, 그리고 내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전문주 방송작가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