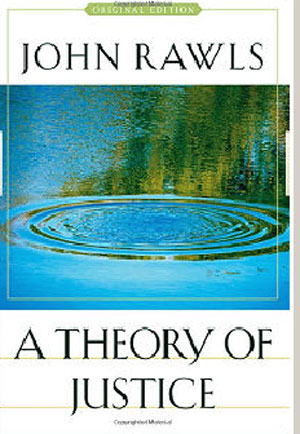
'공정 사회'가 세간의 화두다. 공정 사회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나 계층 간 불평등, 그로 인한 위화감 해소, 편법과 반칙의 근절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관련해서, 최근 출판된 미국 하버드 대학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국내 판매 돌풍은 공정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증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공정(fairness)은 불편부당(impartiality)과 함께 정의(justice)의 하위 개념이다. 공정은 주로 정의의 절차상의 특징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결과 상태(end state)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정의'는 '저스티스'(justice)의 번역어로 직감적으로 그 뜻이 전달되지 않는 번역어다. 저스티스를 그 의미상으로 번역할 때 가장 적합한 단어는 '고름'이다. 여럿이 차이 없이 한결같고 가지런하다는 뜻이다.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사회를 '칼리폴리스'(Kalipolis), 즉 '고르고 아름다운 사회'라고 파악한다.
사실 정의 사회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니다. 1980년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국정운영 목표가 제시되어 정권 홍보용 프로파간다로 이용되다가 폐기되었다. 정의가 공정으로 바뀐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공정한 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이론적인 대답은 존 롤즈의 『정의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쟁적이며 기념비적인 저작은 금세기에 쓰인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서 중의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가정한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극대화하려는 기본적인 동기와 사회 운영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되는 정의의 원칙은 첫째, 모든 개인들의 완전한 자유의 보장, 둘째, 타고난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최대의 사회적 배려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롤즈가 시사하는바, 우리 사회의 기득권 계층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지의 베일이다. 나와 내 주변 권속의 이해관계 및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려의 완전한 배제!
류재성(계명대 미국학과 교수)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