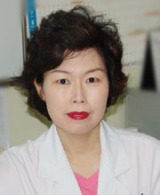
이따금 지난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다. 눈이라도 내릴 듯 가라앉은 날이면 더욱 그렇다. 의사로서의 일상, 바빠도 지금의 생활은 수련 시절에 비교가 안 된다. 힘들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었던 그날들이 생각나곤 하는 것은 예전 같지 않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때문일까.
오래전 어느 날 회진 시간이었다. 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달려가 보니 오미자 빛으로 물들어가는 바지춤을 잡고 못 견뎌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햇병아리 의사이던 나는 그 선홍색을 보자 가슴부터 뛰고 식은땀이 났다. 모두가 긴장되는 검사였지만 참 순조로웠던 아이였다. 그런데 피오줌을 누고 있으니 큰일났구나 싶었다.
찬찬히 살피시던 은사 선생님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환자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고는 우리를 돌아보며 딱 한마디 하셨다. "여기 한 사람 붙어라." 빈틈없이 살피고 필요한 처치를 그때그때 잘해서 별 탈 없게 하라는 지시였다. 아이의 상태도, 보호자의 걱정도 딱 붙어서 챙기다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마음이 통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리라. 간결한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불호령이었다. 늘 환자 곁에서 빈틈없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였다.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도 휑하니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밀려드는 응급환자와 끊임없는 병실 일 때문에 대개 비번인 사람이 불침번을 서게 된다. 그러니 여러 날 집에 못 가는 경우도 생긴다. 며칠 계속 밤샘을 하다 보면 피곤에 절어 어느 쪽이 환자인지 누가 의사인지 분간이 안 갈 때도 있다. 지켜보던 환아 옆에서 순간적으로 졸았는지 낯선 느낌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서기도 한다. 아이의 이부자리를 끌어다 덮어주는 보호자의 손길이다. 우리 애 상태는 괜찮으니 눈 좀 붙이란다.
결혼 인사를 하러 찾아뵈었을 때였다. 그때도 선생님은 "꼭 붙어 있어라"고 하셨다. 의사가 환자 진료만 열중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이해를 못 받아 부부 사이가 덜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 이불을 덮다 보면 해결된다고 하셨다. 아픈 이를 돌보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지만 혼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 하는 상대방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리라. 사이가 안 좋아진다 싶을 때는 꼭 그렇게 붙어 있으라고 하셨다.
살다 보니 그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다. 수십 년을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온 개개인이 서로 잘 이해되기는 힘들 것이다. 때로는 공연한 일로 얼굴 붉혀야 하는 때에 내 가슴속엔 그 말씀이 들려온다. 어느 여름저녁, 산사에 울려 퍼지던 운판의 소리처럼.
정명희 대구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댓글 많은 뉴스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자"…거리 정치 나선 2030세대 눈길
민주,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 추진"
젊은 보수들, 왜 광장으로 나섰나…전문가 분석은?
윤 대통령 지지율 40%에 "자유민주주의자의 염원" JK 김동욱 발언
尹 탄핵 집회 참석한 이원종 "그만 내려와라, 징그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