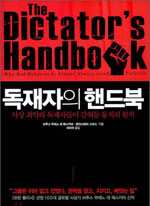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알라스테어 스미스 지음/ 이미숙 옮김
2012년 세계는 정치 빅뱅과 혼돈의 정치 계절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58개국이 새로운 통치자를 뽑는다. 각 나라마다 당면한 문제를 파헤치고, 정치인들의 꼼수를 고발하는 시사프로와 책, 기사들로 넘쳐난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지만, 임기가 마무리 될쯤에는 예외 없이 '실패한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힌다. 왜, 그렇까?
이 책은 여느 정치철학 책처럼 어떤 정치가 옳은 정치인가를 논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의 지도자, 조직, 권력을 몇 가지 원칙으로 꿰어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정치의 규칙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는 있다. 새로운 판을 짜려는 사람이라면 이 규칙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 이 규칙을 성공적으로 '적용' 하느냐에 따라 대권의 향방은 정해질 것이다.
흔히 우리는 폭군이나 독재자와 성군 또는 훌륭한 통치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자는 "정치적 행동에 독특한 요소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다. 정치란 '정치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이고 '정치의 주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을 하는 데 급급한 개인들'이라고 강조한다. 정치인이 주장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는 '나의 출세(이익)를 위해…'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독재자들은 이 원칙을 극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일 뿐이다. 어떤 조직에서든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은 리더이기 때문에 정치의 원동력은 통치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과 조치라는 사실을 이 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전제는 기업,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정치(?)에 똑같이 해당된다.
뉴욕대 석좌교수이자 미국 학술원 회원이면서 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저자 메스키타의 경력은 이 책의 깊이가 만만찮음을 보여준다. 공저자 스미스 교수는 2년마다 40세 미만 최고의 국제관계 분야 학자에게 주어지는 '칼 도이치 상'을 수상했다.
핵심적 분석틀로 명목 선출인단, 실제 선출인단, 승리연합이 제시된다. 명목 선출인단은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고, 실제 선출인단은 그의 지지가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며, 승리연합은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간단히, 대체 가능 집단, 유력집단, 필수집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세 집단은 모든 조직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독재와 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다. 독재란 규모가 큰 대체 가능 집단에서 선발한 극소수 필수집단과 비교적 적은 수의 유력집단에 의존하는 정부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유력집단과 대체 가능 집단을 토대로 삼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생존의 첫 번째 원칙은 승리연합을 최소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집단이 작을수록 통치자의 통제권과 지출에 대한 재량은 커진다. 수백만 명이 굶주려 죽는 북한에서 3대 세습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둘째 명목 선출인단은 최대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 쉽게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선출인단 규모가 크면 구성원들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충성을 한다. 그 다음 수입의 흐름을 통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궁핍하게 만들어 얻은 돈으로 지지자를 부자로 만드는 현금 흐름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지지자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헤매지 않을 정도만 보상하고 그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지지자의 주머니를 털어서는 안 된다. 승리연합에 지나치게 야박하게 구는 행위는 권력의 몰락을 뜻한다.
이 원칙은 독재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권력의 본질과 비밀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든 변하지 않는다. 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민주주의를 내세운 독재 아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독재자와 그에 기생하는 권력자들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끊어낼 도끼가 될 것이다. 439쪽, 1만6천원.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