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지만 큰 한국사, 소금/유승훈 지음/푸른역사 펴냄
1895년 음력 정월 27일 낙동강 소금배의 선주 최 씨는 부산의 하단포구에 도착했다. 소금배는 장을 담그는 음력 2~3월이나 음력 10~11월 낙동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 소금을 내다 판다. 당시 영남 지역 최대의 소금 생산지는 낙동강 하구인 부산 명지동이었다. 최 씨는 이곳에서 명지 소금을 잔뜩 싣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랐다. 목적지는 경북 상주 낙동진. 뱃길은 험하기만 하다. 거센 비바람에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수심이 낮은 곳은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가야 한다. 최 씨가 낙동강 중류인 경북 선산 비산포구에 도착하기까진 꼬박 한 달이 걸렸다. 얕은 수심 탓에 여기서부턴 작은 배 두 척에 소금을 나눠 싣는다. 상주까진 앞으로 사흘을 더 가야 한다. 이윽고 상주 낙동진. 강바닥이 거의 드러나지만 소금배는 멈추지 않는다. 다시 지류를 타고 상류를 거슬러 안동까지 갔다. 이렇게 소금배는 낙동강 하구에서 안동까지 500여㎞의 대장정을 거쳤다.
세상에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소금밖에 없다. 요즘은 '건강의 적'으로 천대받지만 소금이 없으면 어떤 음식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금은 고대부터 국가를 지탱하는 경제 원동력이자 절대자의 힘을 상징했다.
'작지만 큰 한국사, 소금'은 한국 소금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한국사를 들여다본 책이다. 소금의 교통로였던 강과 소금 전매를 통해 세수를 늘리려 했던 고려와 조선의 정책, 일제강점기 전통적인 자염(煮鹽)이 사라지고 천일염이 대세가 된 과정 등을 소상히 담았다. 또 소금장수와 관련된 설화와 전통 소금인 자염의 생산 비법, 소금의 주술적 힘 등 문화사적 의미도 다루고 있다.
국가는 일찍부터 소금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세금을 거두고 재정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렸고, 백성은 늘 소금 때문에 고통받았다. 다산 정약용은 소금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염범을 내놨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일제는 대만에서 들여온 천일염 제조법을 확산시켜 전통 소금인 자염을 몰락하게 했다. 일제가 자염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천일염에 매달린 건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한 공업 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일제가 북한에 천일염전을 집중적으로 만든 탓에 해방 이후 남한은 고질적인 소금 부족에 시달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인 전남 신안은 북한 피난민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 있다. 6'25 전쟁 당시, 국내 천일염 생산지는 대부분 이북에 집중돼 있었다. 만성적인 소금 부족에 시달리던 이승만 정권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염전 축조에 피난민을 투입했다. 변변한 토목 기계 하나 없던 시절, 거의 농기구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거대한 염전이 만들어졌다.
책 갈피갈피 전북 곰소만과 충북 태안, 낙동강 하구, 전남 신안 등 염전의 고향을 찾은 답사기가 실려 흥미를 더한다. 저자는 "짠맛의 시대성은 '상전벽해'가 됐다"고 말한다. 미네랄이 풍부했던 자염은 제조가 쉬운 천일염으로 대체됐고, 다시 나트륨을 극대화한 정제염에 몰두하다 웰빙 열풍과 함께 천일염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420쪽. 2만원.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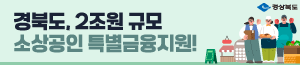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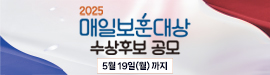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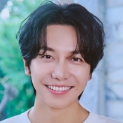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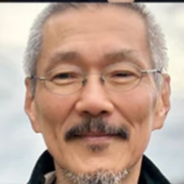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확정…TK 출신 6번째 대통령 되나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민주당도 동의해야"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文 "이재명, 큰 박수로 축하…김경수엔 위로 보낸다"
이재명 "함께 사는 세상 만들 것"…이승만·박정희 등 묘역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