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6년차 선생님입니다. 예민하고 감수성 풍부한 여자 아이들과 나보다 큰 덩치로 매일 격한 장난을 치는 터프한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선생님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청소해도 교실 구석구석 쌓여있는 먼지들은 살아오면서 잔병치레 전혀 없던 나에게 비염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점심시간 "선생님, 치킨은 몇 개씩 줄까요?" "OO이가 김치 너무 많이 줬어요!" 하는 아이들 앞에서 '나는 과연 선생님일까? 급식 도우미일까?'라는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발령 첫 해에는 아이들을 혼내면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 다음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불같이 혼을 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수업에 임합니다. 아, 부푼 꿈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단에 섰던 첫 발령의 설렘은 벌써 먼 추억이 되어 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선생님으로서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초반 아이들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은 막내 이모 같은 편한 선생님이 돼 아이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작년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나는 종종 아이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씩 올려놓은 후 퇴근했습니다. 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서운한 날에는 섭섭했다고 장문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삐친' 티를 적나라하게 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글을 쓰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실망스러움이 어느새 긍정으로 바뀌고 스스로 미소를 짓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교내 평가가 겹쳐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힘들었던 어느 날, 태민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날씨도 덥고 시험도 많아서 모두가 예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이 모두 끝나고 나면 원래 우리 반 친구들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 선생님도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그 글을 보면서 삐친 마음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에게서 "우리 선생님은 잘 삐치는데 또 조금만 달래 주면 금방 풀려! 완전 초딩이야!"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었지만 나와 아이들은 그렇게 깔깔거리며 행복해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무엇이든 함께 이야기합니다. "애들아, 선생님 오늘 소개팅 나가는데 옷 어때?"라고 물으면 센스 있는 여학생들은 옷매무새 이곳저곳을 봐주기도 합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소개팅에 나온 남자 어땠어요?"라는 질문공세를 받아야하는 고통도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스스럼없이 나누면서 아이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졌어요.
나는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보다는 아이들이 편하게 선생님을 대할 수 있는 친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어떤 이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래서 우리 교실이 한 해 동안 정말 행복하다면 나에게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입니다.
오늘도 교실에서는 선생님을 놀리며 장난치는 아이들과 그 장난을 받아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내 제자들이 늘 행복하고 즐겁게 학창시절을 보내기를, 또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느 청년의 날에 친구 같았던 선생님을 떠올리며 조언 한마디를 구할 수 있기를, 오늘도 '평생 최고 선생님'으로 기억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오유진 동평초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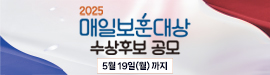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험지 경북' 찾은 이재명 "제가 뭘 그리 잘못을…온갖 모함 당해"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홍준표 "탈당,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잠시 미국 다녀오겠다"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 기구 구성…"한덕수 측과 협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