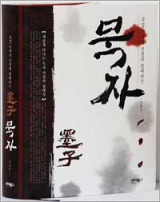
묵적(墨翟)을 높여 '묵자'라고 한다. 묵적은 전국시대 초기의 사상가로 출생연대나 출생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BC 5세기 중반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묵자'라는 책은 BC 390년경에 만들어졌다. 묵자는 '겸애'(兼愛)와 '비공'(非攻)을 주장해 당시 양주(楊朱)와 더불어 일세를 풍미했다.
맹자는 "천하에 묵가의 말(사상)과 양주의 말이 가득 찼다. 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내가 공자를 배워 유가사상을 전파하려고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원래 '묵(墨)'은 '먹'이라는 뜻인데, 또한 '묵형'(墨刑)이라는 형벌이기도 하다. 묵형은 얼굴에 먹물로 죄인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 묵적이 이 형벌을 당해 사람들이 멸시하며, '묵'이라고 부른 것이 그만 그의 성이 되고 학파의 이름이 되었다.
묵적은 원래 노나라에서 태어나 처음 유가를 배웠으나, 점차 유가의 가족주의'예악주의'문화주의 등에 싫증을 느끼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고 한다. 이것은 유가의 귀족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하층민에 대한 연민, 강대국에 의한 침략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약소국에 대한 동정이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에 공감하는 많은 하층민이 그를 지지하고, 약소국을 위한 방어전쟁에 기꺼이 나서게 되자 당시 행동 집단으로서도 큰 세력을 형성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잘 말해주는 것이 '겸애'와 '비공'이다.
겸애는 직역하면 '겸하여 사랑한다'는 뜻인데, 유가의 가족애를 비판하는 뜻이 들어 있다. 그는 유가의 혈연에 치우친 사랑을 '별애'(別愛)라고 하였는데, 말하자면 '사랑이 차별적'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박애'라는 보편 사랑을 겸애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된다. 이는 가족애라는 자연적인 사랑에 대해 사랑의 '초월'을 말하는 것인데, 유가 입장에서 '널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이를 더욱 공경하라'(汎愛衆而親仁)는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중국 전통의 농업사회에서는 가족애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다. 유가가 농업경제와 관련이 있다면, 묵자의 겸애는 난세에 방어전쟁에 나가는 하층민의 단체생활 조직과 관련이 있다. 비공은 '전쟁(침략 전쟁)의 부정'이라는 뜻이다. 약소국에 대한 동정은 바로 겸애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유가사상을 비판한 내용에 '절용'(節用), '절장'(節葬), '비악'(非樂) 등도 있는데, 제목만 봐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된다. '절용'은 '아껴쓰는 것'이니 유가의 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절장'은 '장례를 간소하게 하자'는 뜻이니, 역시 유가의 번다한 상례와 비용 낭비를 비판한 것이고, '비악'은 음악의 낭비성을 비판한 것이니, 모두 유가를 겨냥한 것이다.
이동희 계명대 윤리학과 교수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https://www.imaeil.com/photos/2025/04/25/20250425181904121745572744_l.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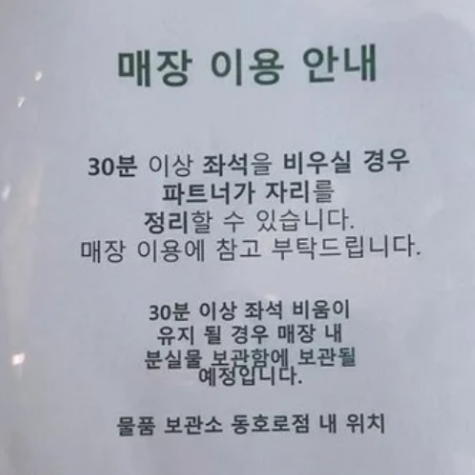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
文, 뇌물죄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尹 탄핵에 대한 보복"
이재명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