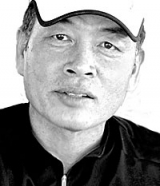
운이 좋았던지 군대시절에는 왕고참 생활을 꽤 오래 했다. 2월에 제대를 했으니 군 시절 마지막 겨울은 그야말로 행복한 날들이었다. 내복만 입고 있어도 따뜻한 페치카(실내 난로) 옆에서 김성종의 추리소설을 읽으며, 페치카 아궁이에서 갓 끓여온 라면을 먹곤 했다. 때로는 침상 밑에 숨겨놓은 더덕주까지 곁들였으니 호화 생활이 따로 없었다.
무료한 날들이어서 주말이면 외박을 나갔다. 작전과 선임 둘과 삼총사를 이뤘다. 문제는 경비였다. 술값과 여관비가 사병 봉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총 잃어버려 총 사야 한다'며 '돈 보내 달라'고 집에 편지를 쓰는 불효막심한 병사도 있었으나 우리들은 착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돈 가져다 쓰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술이나 밥값은 주로 대대본부에 근무하는 학군 장교들을 만나 해결했다. 상급부대인 연대본부에 근무하는 우리들을 못 본 척하지 못했다. 의무 복무연한을 채워야 하는 ROTC 장교들은 우리 사병들과 신분은 달랐지만 국방부 시계에 목을 매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동병상련을 느끼는 처지였다. 나이도 비슷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장교였다. 봉급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우리는 얻어먹는 자의 기본자세를 잊지 않았다. 아부를 떨며 기분을 맞춰주었다. 비굴했지만 배는 불렀다.
문제는 숙박이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고 하던가! 읍내에 하나밖에 없는 장급(莊級) 여관에 물 새는 빈방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주말이면 방이 모자랐지만 물이 새서 비워둔다는 정보였다. 그 방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모두들 잠든 새벽 2시쯤 들어가 아침 일찍 조용히 나왔다. 수부(受付)의 아줌마는 늘 졸고 있었다. 투숙 횟수가 늘자 나중에는 수부에서 수건과 칫솔까지 받아올 정도로 대담해졌다. 하긴 워낙 손님이 많아 누가 몇 호 손님인지 알기도 어려웠다.
'눈치만 빠르면 절간에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어령 교수는 "눈치는 단순한 센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혜"라고 말했다. 돌이켜보니 30년 전, 이미 20대 중반일 때 우리는 벌써 그렇게 능란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갔던 것이다. 그때의 경험들이 요즘 사회생활에서도 자양분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흔히 군대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니 딱할 뿐이다.
장삼철/(주)삼건물류 대표 jsc1037@hanmil.net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