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구할 생각은 않았다.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당시 촬영한 9분 45초짜리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 처음 달려온 구조보트에 가장 먼저 올라탄 것은 승객의 안전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었다. 승객은 한 명도 없었다. 선장이 일찍 탈선 명령이라도 내렸더라면, 이들 중 누구 하나라도 구조선에 올라타기에 앞서 선실의 승객부터 구하자고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무책임했고 해경은 무능력했다.
첫 구조 요청은 오전 8시 52분 학생이 했고 오전 9시 30분 첫 경비정이 도착했다. 경비정 도착 후 배가 완전 뒤집힌 오전 10시 31분까지는 1시간이 걸렸다. 이 긴 시간 승객들은 '절대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선실에서 기다린 것이 전부였다. 오전 10시 17분, 선실에 갇혀 있던 학생의 마지막 문자는 '기다리래 기다리라는 방송 뒤에 다른 안내방송은 안 나와요'였다.
아이들은 이보다 훨씬 앞선 9시 4~5분 이미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로 배 기울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줘'라는 등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아이들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선장은 대피 방송조차 외면했다. 구조 책임이 있는 해경 역시 선체에 진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탈출을 독려하지도 않았다.
첫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조금이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어렵게 선실에서 버티고 있었다. 배는 5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다. 좌현 3'4층 객실도 아직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이 정도 배가 기울었다면 자력 탈출은 불가능하지만 구조는 가능했다. 누군가는 선실 안으로 들어가든지, 선실 유리를 깨서라도, 소방 호스를 풀어서라도 구했어야 했다. 어느 한 선원이나 해경이 객실 안에 갇혀 있을 승객들을 생각했더라면 결과가 이토록 허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고 후 구조를 위해 현장에 달려갔던 한 어부의 외신 인터뷰가 귓전을 때린다. "구명조끼를 입고 객실에 갇혀 살려 달라고 아우성치던 아이들의 표정을 평생 지우기 어려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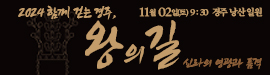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