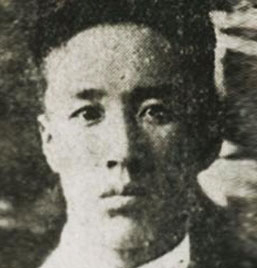
가난한 남자가 있었다. 함경도 골짜기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이 남자는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가난 때문에 고향을 등졌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 땅 중국 간도로 떠났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난했다. 그래서 결국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너무 가난해서 아내는 도망을 갔고, 가난해서 제대로 밥을 얻어먹지 못한 어린 딸은 목숨을 잃었다.
사는 동안 한 번도 가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남자는 마침내 시골에 두고 온 노모와 어린 아들의 얼굴도 다시 보지 못한 채, 서른셋의 젊은 나이로 가난한 삶을 마감한다. 글쓰기는 가난 속에서 죽음 이외에는 무엇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남자의 적막한 삶을 밝혀준 유일한 빛이었다. 이 남자가 작가 최서해(1901~1933)이다. 최서해의 소설 '탈출기'(1925)는 자신이 겪은 가난의 체험을 기록한 작품이다.
간도의 조선 이주민 가족의 비참한 삶을 다룬 탈출기가 발표되었을 때, 당대 조선문인들, 특히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주창한 작가들은 앞다투어 칭찬하였다. 동경 유학생 출신의 엘리트 작가들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생생한 '체험'이 탈출기에는 있었기 때문이다. 소작농과 지주, 노동자와 공장주인의 대립이라는 판에 박힌 이론적 틀에 맞추어 전개되었던 소위 엘리트 작가들의 작품은 최서해가 체험한 현실의 힘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론서를 통해서 '학습'했던 동경유학 출신의 엘리트 작가들의 감각과 머슴에서부터 품팔이 노동 등 생존을 위해서 최하위층의 일을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최서해의 삶의 감각은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탈출기에 대한 조선 문단의 열렬한 환호와 문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서해는 여전히 가난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문인 누구나가 꺼리던, 기생들 잡지를 만드는 일도 자청했다. 자기 한 사람의 숙식밖에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월급이지만 그 몇 푼의 월급을 위해서 잡지사의 궂은일은 물론 잡지사 사장의 외도 심부름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다. 어린 딸아이가 죽고, 아내가 도망가고, 동료 문인이 기생과 동침하는 방 윗목에 죽은 듯 얹혀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멸스러운 상황을 맞으면서도 그는 견디고 견뎠다. 그 인내의 끝에는 언제나 문학이 있었다. 어떠한 모욕도, 무시도, 그리고 현실적 한계도 문학을 향한 그의 열정과 집념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문단의 언저리에 악착같이 붙어 앉아서 최서해는 끊임없이 작품을 썼다. 하층계급들의 비극적 삶의 현실을 사람들에게 글로 계속 전달했다. 글을 쓰는 그 순간만은 적어도 그는 보통학교 중퇴의, 보잘것없는 가난뱅이가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운명에 대한 강한 소명의식을 지닌 작가 최서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최서해야말로 식민지를 살았던 그 어떤 작가들보다도 '자존감'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정혜영 대구대 기초교육원 강사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