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각국은 저마다 치매와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전 세계 치매 환자는 무려 4천400만 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2050년이면 1억3천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비교적 선진국에서도 치매 환자 중 20~50%만이 환자로 등록돼 기본적인 관리를 받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10년 기준 전 세계에서 치매와 관련해 쓰인 비용은 무려 6천40억달러(약 634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를 국가별 경제규모로 환산한다면, '치매'라는 국가는 전 세계 18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가 될 것이다.
◆6분마다 한 명꼴 치매 발생
호주에서도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호주의 치매 환자는 33만2천여 명을 헤아린다. 이 숫자는 10년이 채 안 돼 33%가량 증가한 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단의 치료법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2050년이 되면 치매 환자는 무려 90만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에서만 매주 1천700명의 새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6분마다 한 명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그나마 현재 상황은 2050년 예상치에 비하면 다행스럽다고 할 정도다. 앞으로 36년 뒤에는 매주 7천400명의 새 치매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분 30여 초마다 치매 환자가 생기는 것이다. 의료 시스템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85세 이상 노인 인구 3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젊은 치매도 심각한 문제다. 현재 호주에는 2만4천700여 명의 젊은 치매 환자(30대를 포함한 65세 이하)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 써버리는 주범, 치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만 1천200만 명에 이른다. 치매는 이미 호주에서 사망 원인 3위에 올라 있고, 이렇다 할 치료법도 없다. 의료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기 3년 전쯤 이미 가족들은 부모나 형제의 치매 증상을 눈치 챈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증상 시작 후 3년이 흘러서야 진단을 받는다는 말이다.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장애 진단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고, 장애로 인한 전체 사회적 부담 중에서 세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치매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비교적 치매 관리 시스템이 잘 정착된 호주에서조차 2029년이면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치매 관리사가 15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9'2010년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인 건강보험 및 고령보험 직접 지출액만 49억호주달러(약 4조5천423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치매는 건강보험 재정을 써버리는 세 번째로 큰 주범이 될 것이며,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치매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영리기관이 치매정책 수행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주는 일찌감치 치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른 1950, 60년대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00년대 초반에 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가 됐다. 50년간 이어진 고령화 기간을 거치며 비교적 탄탄한 치매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호주의 치매 관리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실제 역할을 비영리 기관인 '호주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Australia'이하 AA)에서 맡는 형식이다. 이곳은 치매 관리정책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보건노인부'의 지원과 기업체 후원을 기반으로 치매 연구 및 인식 개선, 가족 지원 등을 실시하는 비영리 단체다.
AA는 치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치매 환자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전문적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치매통합상담콜'을 운영한다. 아울러 호주에는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험과 비슷한 '노인보호'(Aged Care)를 통해 운영되는 다양한 요양시설이 발달해 있다.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 전문요양 등 치매 등급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진다.
AA 서호주지부 한 관계자는 "치매 요양시설은 매년 4개 영역, 50여 종의 까다로운 인증기준 적합심사를 거쳐야 요양기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평가기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용자들이 직접 평가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이다. 부단한 노력으로 이용자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요양기관 자격을 박탈당한다. 여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제2의 집으로 자리매김한 요양시설
퍼스 도심을 조금 벗어난 외곽 주택가 한쪽에 자리 잡은 한 치매요양시설을 찾았다. 물론 이곳에 치매 환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노인질환을 앓아서 식사, 잠자리, 씻기 등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함께 머물고 있다. 출입은 병원과 달리 자유롭지 않았다. 내부에 있는 직원을 호출해야만 가능했다. 환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설은 한마디로 깔끔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정갈한 분위기였다. 마침 식사시간이어서 식당에 함께 모여 점심을 먹는 노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메뉴는 서로 달랐다. 고혈압'당뇨 등 노인성 질환에 따라 다른 식단이 제공되는 것이다. 음식 맛은 꽤 훌륭한 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마조리 로일(83) 할머니는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또래 친구들도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로일 할머니의 자녀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거동이 불편한 에블린 포터(90) 할머니 곁에는 늘 도우미가 따라다닌다. 포터 할머니는 "이곳에서 생활한 지 7년이 넘었다"며 "이제는 이곳이 집이 됐고,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틈틈이 찾아온다"고 했다.
퍼스에 있는 치매 연구기관인 '맥커스커 알츠하이머 연구재단'의 주디 에드워즈 총괄국장은 "치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치매 진단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스스로 찾아와 치매검사를 받는다"며 "치매의 조기검진이 활발해지면서 치매가 찾아와도 일상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글'사진 김수용 기자 ksy@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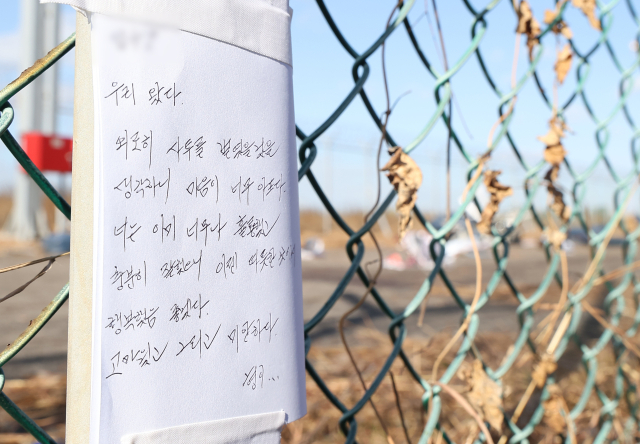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전광훈, 무안공항 참사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발언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