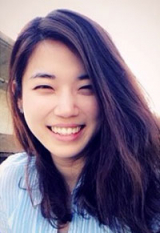
대학교 1학년, 첫 소개팅 상대는 호감형이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 다정한 말투와 행동, 명문대를 다닌다는 점까지. 첫인상이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대였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그 좋은 '연애 스펙'을 가지고도 연애를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모태 솔로'라는 점이었다. 그의 치명적인 매력을 덮어버린 치명적 단점은 무엇이었을까. 그와 보낸 단 몇 분 안에 나는 안타깝게도 그의 단점을 눈치 챌 수 있었다.
그는 '시간 쪼개기'의 달인이었다. 그는 약 90분의 식사시간 동안 서른 번은 넘게 시계를 확인했다. 잠시라도 대화가 끊길 때면 소개팅이 끝난 뒤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말에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외우듯 늘어놓았다. 계획은 시간 단위로 치밀했다. 그의 행동에 덩달아 불안해진 나는 "참 계획적이시네요"라며 칭찬을 빙자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준비된 듯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학창시절 때부터의 습관이에요. 재수 시절에는요, 초 단위까지 쪼개서 계획을 세웠어요!"라며 해맑게 웃는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소개팅 상대가 아니었다. 이 사람과 지내다간 내 인생도 초침과 분침에 산산조각날 것 같았다. 안타깝게도 나 역시 그를 '모태 솔로'의 수렁에서 구해주지 못했다.
그날 소개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왼팔을 내려다봤다. 그리곤 팔목을 감싼 시계에 귀를 갖다 댔다. 그날따라 '째깍째깍' 시곗바늘 움직임이 심장을 울릴 만큼 크게 느껴졌다. 얼른 시계를 풀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곤 일상을 돌아봤다. 나 역시 그와 다를 바 없이 늘 시간의 통제 안에서, 시간을 쪼개 쓰기에 바쁜 사람이었다.
물론 그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었다. 하지만 나의 첫 소개팅이 남긴 교훈은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다. 소개팅 남의 습관은 나를 비롯한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습관이라는 것이다.
요즘은 누구나 시간에 쫓겨 살지만 그 증상은 12월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12월의 시간은 다른 어떤 때보다 짧게, 그리고 아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번 먹어야지", "연말이니 얼른 만나자"와 같은 인사말이 자주 들린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12월 달력은 다른 달에 비해 더 빼곡하게 채워진다.
한 해의 마지막인 요즘, 흐르는 시간이 아까운 만큼이나 시간을 쪼개 써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만큼 주변에 소홀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왼쪽 손목에 찬 시계를 내려다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달력 속에 약속들을 꾸역꾸역 밀어 넣을수록 첫사랑도 아닌 첫 소개팅 남을 떠올린다. 혹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정작 함께해야 할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건 아닌지, 바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하고 말이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