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존을 둘러싼 갈등이 시끄럽다. 필자 주변에 스크린골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업주들이 많아 유독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단순히 소통 부족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필자의 오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깊어졌다. 전국골프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생기고, 한 달 동안 4번의 장외집회가 펼쳐졌다.
지난 몇 년 동안 골프존은 고속성장의 신화를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스크린골프 매장의 규모도 점점 커졌다. 2008년 영남권대회 결선이 펼쳐진 곳은 스크린 룸 5개의 A스크린골프(대구 수성구)였다. 그해 B파크는 8개의 스크린 룸을 개장,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대부분이 룸 4개 이하의 매장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 문을 연 스크린골프 매장은 기본이 8~10개다. 대형할인점이 주위의 구멍가게들을 흡수하듯 이들은 주위의 소형 스크린골프점을 삼켜버렸다. 약자의 처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
골프존은 이들을 배려해야 했다. 배려까지는 아니라도 그들을 시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쯤은 베풀어 줘야 했다. 왜냐하면 골프존 고속성장 신화는 그들이 없었다면 기록할 수 없었을 테니까.
2002년 매출 20억원의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골프존은 2013년 3천652억원으로 11년 동안 180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 2011년에는 업계 최초로 코스닥 상장, 시가 총액만 1조원 이상, 7천억원이 넘는 주식평가 이익을 거뒀다. 국내 스크린골프 점유율 61.05%(2012년), 전체 시장점유율은 84.1%(2013년)에 이르렀다.
소형 스크린골프점들은 조강지처다. 혹자는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런 면에서 얼마 전 모 아웃도어의류업체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ㄱ사장은 10평 남짓한 매장에서 오랫동안 그 업체의 가맹점으로 장사를 해왔다. 문제는 인근에 대형건물을 갖고 있던 ㄴ사장이 새로 가맹점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의류업체는 오랜 고민 끝에 ㄴ사장에게 "10평 남짓한 ㄱ사장의 매장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게 어렵다면 "ㄴ사장의 매장을 ㄱ사장에게 임대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역제의까지 했다. 초기에 함께 고생했던 ㄱ사장을 버릴 수 없다는 이유다.
이 의류업체처럼 골프존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골프존 사업자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창업 초기 골프존은 '세상에 없는 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들에게 '세상에 없는 상생 안'을 요구한다면 무리일까? 이 냉혹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런 희망을 꿈꾸는 것이 부질없는 일일까?
지금은 골든타임이다. 골프존의 신화를 써내려간 김영찬 회장이 '세상에 없는 상생 안'을 통해 진정한 영웅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본다.
신용진 월간 위드골프 발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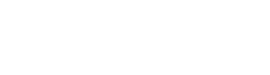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