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10년도 훨씬 전에 대구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억수로 많다, 2번 쌔빌렀다, 3번 천지 삐까리다." 마침 그 방송을 서울 친구와 같이 듣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1번이 답이 아니냐고 했다. 덧붙여 '2, 3번이 많다는 뜻이냐?'고 되물었다. 한 청취자가 전화 연결이 되어서 자신 있게 3번을 말하자 진행자는 실로폰으로 딩동댕을 쳤다.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지만, 서울 친구는 그 방송을 들으며 어떻게 해서 3번이 답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 사람에게 경상도 말의 느낌을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쌔빌렀다는 건 쌔빌렀는 거지, 표준어에 없는 그 느낌을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나. 그렇지만 최대한 번역을 해서 친구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
"'억수로 많다'는 '천, 만, 억'과 같은 숫자를 이용해서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돼. 왜 과장해서 말할 때 '천리만리', '억만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쌔빌렀다'는 여기저기 흔하게 널려 있는 모양을 뜻하는데, 많다는 것을 좀 더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눈에 띌 만큼 흔하고 많다는 뜻이니까, 그냥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을 때 사용을 하지. 기본형이 뭐냐구? '쌔비르다'에 과거형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해서 된 말이 아니냐고? 무슨 그런 거창한 문법을.
'천지 삐까리'에서 '천지'는 하늘과 땅을 뜻하는 천지(天地)라는 건 금방 알겠지? 서울 사람들도 그러잖아. '온통 쓰레기 천지다.'처럼 주로 조사 '이다'를 붙여서 아주 많은 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지.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천지'를 '세상모르고 천지 날뛴다.'처럼 부사로 하기도 해. 그리고 '삐까리'는 표준어로 치면 '낟가리'나 '더미' 정도가 되겠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벼를 베서 낟가리 해 놓은 것을 그냥'삐까리'라고 하고, 짚을 쌓아 놓은 더미를 '짚삐까리', 장작을 쌓아 놓은 더미를 '장작삐까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천지 삐까리'라는 건 온통 무더기로 널려 있다는 것이니까 '쌔빌렀다'보다 느낌상으로 더 많은 것 같은 거야."
예전에는 국어 선생들이 표준어 보급의 최선봉에 서서 사투리를 죄악시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쓰는 말들은 모두 사투리이기 때문에 사투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감의 깊이가 있는 법이다. 아래 시는 바로 그런 시이다.
어머니는 그륵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륵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륵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륵을 앞에 두고
그륵, 그륵 중얼거려보면
그륵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륵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륵이라 배웠다
-정일근, '어머니의 그륵' 중에서
이 시를 읽다 보면 '그릇'이라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는 정감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이젠 '그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투박한 느낌의 용기도 사라지고, '삐까리'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서 그 정감을 전달하기 어려운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https://www.imaeil.com/photos/2025/04/25/20250425181904121745572744_l.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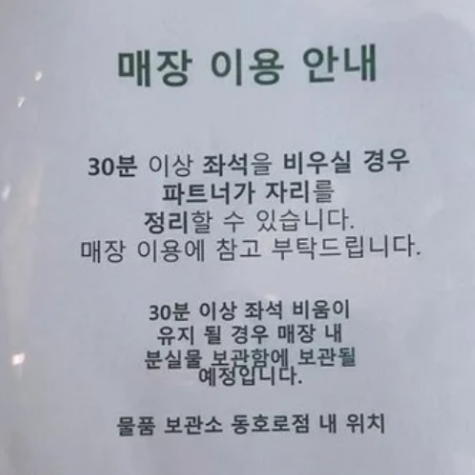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