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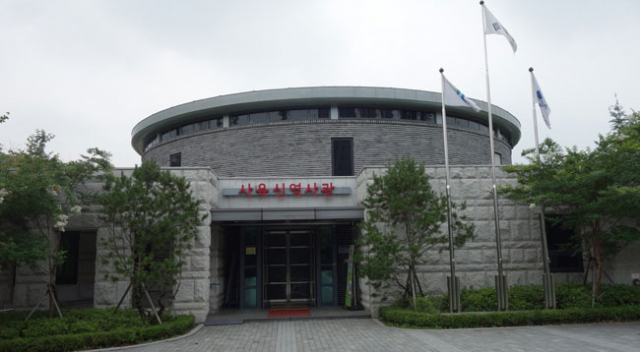


구미 선산 출신의 단계 하위지(河緯地'1412~1456)는 조선 전기의 학자로, 세조가 단종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르자 성삼문, 박팽년과 함께 단종 복위를 꾀했던 사육신 중 한 사람이다. 야사에 따르면 그가 출생한 날부터 3일 동안 생가 앞을 흐르던 시냇물이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 아호 단계(丹溪)는 여기에서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하위지는 조선 전기 문신으로 과거에 급제해 벼슬은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의 강압을 받아 양위하자, 성승, 유응부, 성삼문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꾀했다가 거사 실패를 예상한 김질의 밀고로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틀어박혀 공부…사람들이 얼굴을 몰라
하위지의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하담(河澹)이고, 어머니는 유면(兪勉)의 딸이다. 증조부는 하윤(河胤), 할아버지는 하지백(河之伯)이다. 위로 형 하강지, 동생 하기지 등이 있었다.
하위지는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했다. 워낙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던 탓에 동네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모를 정도였다. 그의 형 강지 역시 책 읽기를 좋아했고, 나중에 벼슬을 했는데, 부정에 연루되어 옥살이를 했다.
하위지는 1435년(세종 17) 생원을 거쳐 143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 집현전 부수찬에 임명되었다. 1444년 집현전 교리(校理)로 임명되어 오례의주(五禮儀註) 상정(詳定'나라의 제도나 관아에 쓰는 물건의 값, 세액, 공물 등을 심사하고 결정해 오랫동안 바꾸지 못하게 하던 일)에 참여했다.
1440년 병으로 사직하자 세종이 특별히 약을 내려 고향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또 경상도 관찰사에게도 하위지를 보살피도록 전지(傳旨)를 내리기도 했다. 1451년(문종 1) 집현전 직전(直殿)에 등용, 수양대군을 보좌했다. 1454년(단종 2) 부제학'예조참의를 거쳐 이듬해 예조참판에 올랐다.
◆세종 "어린 손자 잘 보필해 달라" 유언
세종의 장남이자 왕세자인 이향(문종)은 일찍이 세자에 올라 20년간 아버지 세종을 보필해 문무관리를 고르게 등용하고, 언로를 열어 민정 파악에 힘쓰는 등 국사를 처리했다. 1445년 아버지 세종이 병들자 아버지를 대신해 국사를 처리했으나 병약했다. 세종대왕은 말년에 측근인 집현전 학사들에게 어린 손자 홍위(단종)를 잘 보필해 달라고 자주 당부했다. 임종 때는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앉혀놓고 손자 홍위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 자리에 하위지도 함께 있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 즉위 직후 하위지는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1451년 수양대군을 보좌하여 진설(陣說)의 교정과 역대병요(歷代兵要) 편찬에 참여했다. 대신들의 실정을 공격했다가 왕과 대신들로부터 반격을 받았으나 승지 정이한과 정창손의 비호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문종이 즉위 2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자 사퇴하고 고향으로 낙향했다.
◆"조정 농락 안 된다" 수양대군 비판
세종 때부터 간행한 역대병요가 1453년(단종 1) 봄에 간행됐다.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청해 편집에 공로가 많은 신하의 품계를 올렸다. 그로 인해 하위지는 사헌부 집의(執義)라는 중직에 승진했으나 굳이 사퇴했다. 수양대군의 뜻에 반기를 든 것이다.
하위지는 한발 더 나아가 "서적의 수찬 사업은 집현전의 본래 업무이므로 상을 줄 일이 아니다. 임금의 나이가 어려서 나라가 위태로운데 왕족(수양대군)이 벼슬을 주거나 상을 주는 일을 가지고 대신들을 농락하면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 일로 여러 대신이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으나 수양대군은 사적으로 친한 하위지를 처벌하지 않았다. 1453년 하위지는 자신에게 내려진 직책이 의리상 불가하다고 청해 집현전 직제학에 전보되었다. 그러자 사직하고 신병을 치료해야 한다며 경상도 영산(靈山)으로 떠났다.
1453년 음력 10월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영의정 겸 섭정에 오르자 하위지는 벼슬을 버리고 전사간(前司諫)의 자격으로 선산으로 물러갔다.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청하여 좌사간(左司諫)으로 불렀으나 사퇴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454년 집현전 부제학으로 복직되자 대궐 옆에 있는 불당(佛堂)이 왕실에 이롭지 못함을 들어 이를 훼철할 것을 주장했다.
그 해 부제학'예조참의 등을 역임하고 1455년(단종 3) 다시 직제학이 되었다가 예조참의가 되었다. 1455년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하고 예조참판으로 부르자 마지못해 취임했으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해 녹을 받는 대로 별실에 쌓아두기만 했다. 그 뒤 예조판서로 다시 승진 제수되었다.
세조는 즉위 후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삼정승과 좌찬성, 우찬성이 육조판서들의 정무를 결재하는 의정부 서사제(署事制)를 폐지하고 왕이 직접 육조판서들의 서류를 결재하고 정무를 주관하는 육조 직계제로 개정을 추진했다. 하위지는 이를 정면으로 반대해 세조의 분노를 샀다.
◆단종 복위 실패…세조의 용서 거부
1456년(세조 2) 하위지는 성삼문'박팽년'이개'유응부'유성원 등과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김질의 고발로 붙잡혀 의금부에 끌려가 국문을 당했다. 김질은 주동자들과 혈연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성삼문은 단종이 복위됐을 때를 대비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정창손을 포섭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거사 직전 정창손의 사위인 김질을 끌어들였으나 패착이었다. 김질은 단종 복위에 대한 절실함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실패할 것에 대한 불안감에 고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조는 죄인들을 국문하는 자리에 나타나 사적으로 친한 하위지에게 말했다.
"잘못했다고만 하라. 죄의 무겁고 가벼움은 내게 달려 있다."
그러나 하위지는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위지는 국문을 받으면서 세조에게 말하기를 "이미 나에게 반역의 죄명을 씌웠으니 마땅히 주살하면 될 텐데, 다시 무엇을 묻겠단 말이오"라고 했다. 세조는 하위지에게 자신의 편으로 올 것을 요청하였지만 하위지는 거절했다. 세조는 국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형(灼刑'불에 달군 쇠로 맨살을 지지는 형벌)을 가했으나 하위지의 재능과 기백을 아껴 그에게는 작형을 가하지 않았다.
◆거열형으로 처형, 아들들도 사형
하위지는 1456년 6월 8일 거열형으로 처형됐다. 이개, 성삼문, 성승, 박중림, 김문기, 유응부, 권자신, 유영손, 박쟁, 송석룡, 이휘, 석을동 등 13명이 이날 함께 처형됐다. 이에 앞서 6월 7일 거사가 발각되자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원과 국문 도중 사망한 박팽년, 허조의 시신에 대한 거열형이 집행됐다.
아버지가 처형되자 경북 선산에 있던 두 아들 호(琥)'박(珀)도 연좌되어 처형됐다. 작은아들 박은 어린 나이였으나 어머니에게 "아버지도 이미 가셨는데 제가 어찌 혼자 살아남겠습니까? 나라의 명이 없더라도 자결해야 마땅할 입장입니다"고 말했다. 하위지의 딸들은 노비로 전락했다.
아들 하호과 하박은 처형당하였으나 16세 미만이었던 조카 하포, 하귀동(동생 하기지의 아들), 하분(형 하강지의 아들)은 살아남았다. 하귀동은 뒤에 이름을 하원으로 개명하고 하위지의 양자가 되었다.
세조는 다른 사육신은 아들, 아버지, 형제, 조카들까지 처형했으나 하위지만 예외로 하여 그의 어린 조카인 하포, 하원은 사형에 처하지 않고 변방으로 유배 보냈다. 손자가 살아남아 후손이 이어지는 박팽년과 함께 하위지는 직계 후손이 전하는 사육신이다. 하위지는 조선 숙종 때 복권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거열형(車裂刑)= 죄인의 두 팔과 두 다리 및 머리를 각각 수레에 매달고, 수레를 달리게 하여 신체를 찢는 형벌. 중국 진(秦)나라 정치가 상앙이 만들어낸 형벌이다. 같은 극형이지만 능지처참(陵遲處斬)형은 언덕을 천천히 오르듯 고통을 서서히 오래도록 느끼면서 죽도록 하는 형벌이다. 팔다리와 어깨, 가슴 등을 차례로 잘라내고, 마지막으로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 숨지게 한다. 죄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살점을 조금씩 베어내어 오래도록 고통을 느끼며 죽도록 하는 형벌도 능지처참형에 속한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