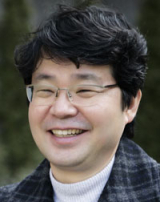
"베니 상띠 스피리뚜스…, 키리에 엘레이송…, 미세레레 노비스…, 알렐루야…."
귓전을 파고드는 이 낯선 언어와 단정한 선율이 넓은 성당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런데 청중은 없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온갖 세상 인연들을 '싹둑' 자른 수도사들이다. 그들은 매일 네 번, 죽을 때까지 이 중세 천년의 노래를 부른다. 자신들을 위해 혹은 하느님을 위해, 거칠고 힘차게 때로는 청아하고 구슬프게!
우리는 이 음악을 뭉뚱그려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명명한다. 이것을 상세하게 이해하려면 서양음악사의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 설명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지면상 생략하기로 하자. 다만 이 장르는 8세기쯤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이름 짓고 체계화했다는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자. 보통 사람들에게 음악은 이론보다 소리가 더 중요하니까.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 틈만 나면 왜관 베네딕도수도원 성당 뒷자리에 앉아 찬트 그레고리안을 듣고 또 듣고, 가끔은 따라 부르기도 했다. 가사의 줄거리처럼 하느님을 찬양하고 용서를 비는 신앙심이 발동한 것은 아니고, 반주도 없이 단선율로만 이어지는 지루한 리듬에 풍덩 빠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그곳을 찾았을까?
60여 명의 남성이 부르는 그 강력한 보컬 사운드에는 극적인 호화로움이나 쾌감은 없다. 대신 정신세계의 간결함과 탈기교의 진솔함, 영혼을 뒤흔드는 음악미가 물씬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리라. 그들에게 그레고리안 성가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자신들의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이승과 저승의 삶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도구로 비쳤다.
찬트 그레고리안은 필자가 가끔 듣던 베토벤과 말러의 교향곡이나 브람스의 소나타, 쇼팽의 피아노곡 등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음악적 공격성, 달콤하거나 우울한 서정성을 주입하지 않았다. 정체 모를 자아의 흔들림을 유도하는 재즈, 인공 조미료를 잔뜩 뿌린 팝과 가요와도 거리가 한참 멀었다.
그렇다고 세속음악의 시적 정취나 자유로운 영혼을 품은 매력까지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단지 이런 사운드들이 필자에겐 황홀한 술처럼 달콤 쌉쌀하기도 했지만 가끔은 괴팍하고 공허하며 위태롭게 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영혼의 비상은커녕 상상력을 짓누르고 일상의 평상심을 뒤뚱거리게 했던 경험도 고백하고 싶다. 한쪽으로 심하게 휜 것을 바로잡으려면 반대쪽으로 화끈하게 잡아당겨야 하는 법. 그래서 오늘 아침 클래식 선율 대신 몬트세라트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녹음한 그레고리안 찬트를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