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윤여정이 주연한 신작 영화다. 가난하고 외로운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며 살아가는 한 할머니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영화다. 아직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대배우 윤여정의 50년 내공으로도 분명 '죽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영화 제목은 '죽여주는 여자', 다소 적나라해 보이지만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
30년 이상 사랑을 하면서 살았다고 자처하는 나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옷으로 상대를 한 번이라도 '죽여준' 적이 있었던가. 예술을 논할 땐 '상업예술일 뿐이야'라며 자신을 위로하고, 반대로 계산을 해야 할 땐 '이건 예술이야'라며 도망 다니기만 한 나를 전신 거울에 한번 들이대 본다.
"당신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라거나, "내가 춤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건강하시라"고 했던 인사가 내가 받은 최고의 찬사였던 것 같다. 그런데 아무도 엄지를 추켜세우며 "죽여준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 죽여주지 못했다는 거지.
내 사랑은 이렇다. 시한부로 평균 두 달만 지속되는 내 사랑의 상대는 90%가 여자다. 능력이 없어 세 다리 이상은 걸치지 못해도, 동시상영(?)까지는 한다. 길게는 수십 년 적게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 '썸'을 타기도 하고 심지어 '밀당'까지도 한다. 수백 건의 사랑 중에 고백하건대 내가 먼저 당신과 사랑하고 싶다며 손을 내민 적은 두세 번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봐서 나는 타고난 바람둥이는 아닐 것이다. 지난해에 사랑을 했든 지난달에 사랑을 했든 간에, 지금의 내 컨디션이 어떤지 간을 보는 것은 상대의 몫이다. 귀한 자식을 얻기 위한 유전자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를, 때로는 산파로서 당신의 순산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길을 추적하고 화대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를 타진한다.
그런 다음 본격적인 사랑을 위한 작업은 시작된다. 사랑의 주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 전개일 때도 있고, 살았던 인생에 대한 반추일 때도 있으며, 지난 시절의 영웅을 떠올리는 것일 때도 있다. 사랑의 결실을 얻기 위해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고 때로는 서로 생각이 달라 다투기도 한다. 아무튼 끝을 알고 시작한 우리의 사랑은 '공연'이라는 결실을 향해 나아간다.
무대 세팅부터 리허설까지 순산을 위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나의 파트너는 최선을 다했노라는 표정을 짓거나 아직도 미진함을 지우지 못한 표정일지라도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손님을 맞는다. 그리고 마침내 공연이라는 사랑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우리는 뜨거운 포옹을 하며 모든 말들을 생략한다. 사랑했던 만큼 탈진했으므로.
그리고 나는 여운을 남기며 언제나처럼 부끄럽게 도망친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능력이 부족해 죽여주지 못해서, "죽여주고 싶었는데"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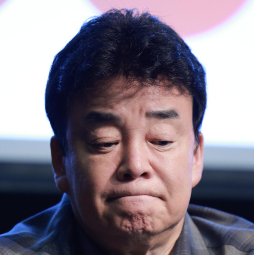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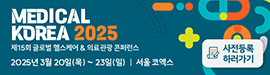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경북대 '반한집회'에 뒷문 진입한 한동훈…"정치 참 어렵다"
한동훈, 조기대선 실시되면 "차기 대선은 보수가 가장 이기기 쉬운 선거될 것"
유승민 "박근혜와 오해 풀고싶어…'배신자 프레임' 동의 안 해"
"尹 만세"…유인물 뿌리고 분신한 尹 대통령 지지자, 숨져
법학자들 "내란죄 불분명…국민 납득 가능한 판결문 나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