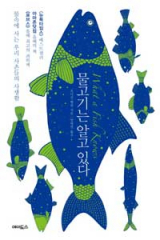
물고기는 알고 있다/조너선 밸컴 지음/양병찬 옮김/에이도스 펴냄
물고기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인식에 반론을 제기하는 책이다. 우리는 흔히 '물고기는 기억력이 3초에 불과한 원시적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또 물 밖으로 끌려나오면 입만 뻥긋거릴 뿐 어떤 표정도 짓지 못하기에 감정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희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류는 '물고기'를 떼로 묶어 지칭함으로써 각각의 물고기를 구별하지 않는다. 워낙에 대량으로 잡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만큼 개체 하나하나에 주목하기 힘든 것이다. 지은이는 이런 인식은 '물고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모든 물고기는 제각기 자서전을 갖고 있을 만큼 독특한 개체들이다. 각각의 개복치, 고래상어, 만타가오리, 레오파드그루퍼는 독특한 패턴을 갖고 있어서 외모를 보고 개체를 구분할 수 있을뿐더러, 내부적으로 각각 독특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한다.
◇지구 척추동물 중 60%가 물고기
인류가 무심코 '물고기'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매우 다양한 동물의 집합체다. 온라인 물고기 데이터베이스인 '피시베이스'에 따르면, 2011년 9월 현재 등재돼 있는 물고기는 3만2천100종(種), 482과(科), 57목(目)이다. 이 숫자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의 가짓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뭉뚱그려 '물고기'라고 부를 때, 우리는 지구 상의 척추동물 중 60%를 지칭하는 셈이다.
현생 물고기는 대부분 2개의 커다란 그룹, 즉 경골어류와 연골어류 중 하나에 소속된다. 대다수는 경골어류에 포함되며, 약 3만1천 종에 달한다. 연어, 배스, 참치, 장어, 가자미, 금붕어, 잉어, 강꼬치고기, 피라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골어류는 약 1만300종에 달하며 상어, 가오리, 홍어, 키메라 등이 이에 속한다. 경골어류와 연골어류에 속하는 물고기들은 육상척추동물의 기관계인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계, 감각계, 소화계, 생식계, 내분비계, 배설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이 무악어류(無顎魚類), 즉 턱이 없는 물고기로 115종이 있다. 칠성장어, 먹장어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그냥 '물고기'(경골어류와 연골어류)라고 말하지만, 사실 경골어류와 연골어류의 차이는 '포유류와 조류'의 차이만큼 서로 다르다. 그래서 같은 물고기라도 참치가 상어보다 인간에 훨씬 가깝다.
◇인류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까
1999~2007년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인류는 매년 1조~2조7천억 마리의 물고기를 죽인다. 물고기 한 마리의 길이를 1달러짜리 지폐 길이(15㎝)라고 가정할 때, 1조 마리의 물고기를 이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왕복하고 2천억 마리가 남는다.
어류학자 스티븐 쿡과 이언 카욱스가 2004년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인류의 여가활동(주로 낚시) 과정에서 매년 470억 마리의 물고기가 육지로 붙잡혀 올라오고, 그중 36%(약 170억 마리)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바다로 돌아간다.
물고기의 사인은 다양하지만, (사람 손에 잡혀 죽는 경우), 주로 질식(물 밖으로 벗어남), 감압(수면으로 올라와 압력이 낮아짐), 압사(커다란 그물 속에서 수천 마리 물고기의 몸무게에 눌러 으스러짐), 내장 적출(육지에 올라온 이후)이다.
◇물고기 피에 오싹함을 느끼지 않는 까닭
모든 척추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물고기) 중에서 인류의 감성에서 가장 먼 동물이 물고기다. 얼굴 표정을 알 수가 없고, 외견상 벙어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척추동물보다 묵살되기 쉽다.
물고기가 인류 문명 혹은 인류의 인식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거의 예외 없이 '사냥감' 아니면 '식량감'이다. 다른 동물을 잡을 때는 '위로의 기도'를 올리거나, 미안함을 느끼지만 물고기를 잡을 때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 물고기를 잡는 장면은 광고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등장하며, 채식주의자들도 물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지은이는 우리가 '물고기 살해'에 관해 '도덕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를 '아마도 물고기가 냉혈동물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온혈동물인 인간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은 생명'으로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에 더 무게를 두게 되고, 그 결과 '물고기의 피'에 대해서는 오싹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지은이는 "어떤 생물이 내장된 온도 조절 장치를 보유했는지 여부가 그 생물의 도덕적 지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물고기에 대한 인류의 두 번째 편견은 '원시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원시적'이라는 말에는 멸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테면 단순하다, 미개하다, 유연성이 떨어진다, 감각이 없거나 둔하다 등.
지은이는 "물고기에게 '원시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지독한 편견의 소산이다. 이런 편견은 '물속에 살던 생물들 중 일부가 육지로 기어올라간 이후 (물에서는) 진화가 멈췄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어떻게 물속에 남은 동물은 진화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일까. 자연선택은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 끊임없이 작동한다"고 강조한다.
◇물고기의 기억력은 정말 3초일까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하고도 금방 다시 낚싯바늘을 문다고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은 '물고기 기억력은 3초에 불과하며, 물고기를 돌대가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지은이는 낚싯바늘에 한 번 걸린 물고기가 다시 낚싯바늘을 무는 까닭에 대해 "몹시 굶주린 물고기는 통증을 느끼더라도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 통증을 망각하고 미끼를 덥석 무는 이유는 식욕이 통증의 트라우마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환경이 너무 불확실해서 먹이를 보면 지나치지 못한다. 굵어 죽기보다는 미끼를 무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모든 '먹이'가 낚시꾼이 던져놓은 '미끼'라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배고픈 물고기 입장에서는 미끼를 노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3초 기억력'과 정반대로 물고기가 통증 기억을 오래 갖고 있다는 일화도 있다. 잉어와 강꼬치고기의 경우 단 한 번 낚였을 뿐인데, 최대 3년 동안 미끼를 회피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험에 따르며 큰입배스는 낚싯바늘 회피 방법을 신속하게 학습하며, 6개월 동안 갈고리 기피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물과 대기의 차이, 물고기와 사람의 차이
육상동물이 대기에 둘러싸여 있듯 물고기는 물에 둘러싸여 산다. 물의 밀도는 공기보다 800배나 높고 압축되지 않는 성질이 있다. 이런 환경 탓에 물고기는 육상동물과 다른 진화 메커니즘을 겪었다. 물고기의 뇌가 작은 것도, 손이나 발 대신 납작한 지느러미를 갖게 된 것도, 유선형의 몸체를 갖게 된 것도 생활환경이 물속이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물고기의 뇌가 상대적으로 작다거나 손이 없다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사고는 뇌 중심적 관점, 인간 중심적 관점일 뿐이다. 우리가 물고기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노는 물'의 차이를 배제하고, 물고기와 사람의 다른 점에 주목하며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낚싯바늘에 꿰여 물 밖으로 끌려나온 물고기가 울지 않는 것은 사람이 물속에 빠졌을 때 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은이 조너선 밸컴은 토론토 요크 대학교와 오타와 칼레튼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했고, 테네시 대학교 동물행동학과에서 박쥐의 의사소통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5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으며, 동물행동, 동물보호, 동물해부 등을 주제로 여러 권의 책과 논문을 썼다.
384쪽, 2만원.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