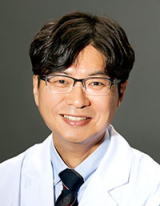
"청진기만 대면 병이 낫는 줄 알고 가슴에 딱 한 번만 대어 달라던 가난한 할머니가 자꾸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고(故) 장기려 박사님이 경성의전 교수직을 마다하고 무료진료 병원으로 향하며 남긴 말이다. 그는 청진기를 댈 때마다 오진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각, 촉각, 청각, 후각'을 통해 중요한 이상을 빨리 알아내는 것이라 했다. 그는 직접 환자의 몸에 귀를 대고 체내의 음을 들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약 200년 전, 프랑스 의사 르네 라에네크가 청진기를 발명하면서 환자 몸에 귀를 대고 진찰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나무막대에서 느낀 음향 현상을 인체에 적용해 청진기를 발명했다. 청진기를 통해 전해진 폐의 호흡 소리, 장의 운동 소리, 그리고 심장의 박동 소리는 오랜 세월 의사들에게 진단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런데 초음파, MRI 등 첨단 의료장비가 등장하면서 청진기가 우리 곁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신체 진찰로 이상 소견을 찾으려 애쓰는 과정은 건너뛴 채 첨단 의료장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 역시 큰 병원의 첨단 의료장비를 보면 마음이 놓이고 동네 의사가 청진기 하나로 진찰을 하면 불안해한다. 이러한 첨단 의료장비를 과도하게 신뢰하는 게 의료 장비의 남용과 과잉 진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람 몸의 미세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까지 감지하는 첨단 의료장비가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가 의사들의 문진과 신체 진찰을 대신할 수는 없다. 자세한 문진과 신체 진찰은 진단의 방향을 정해주고, 꼭 필요한 검사의 폭을 줄여준다. 이를 통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환자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한 의료 선진국에서 오늘날까지도 문진과 신체 진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진기는 오랫동안 의사와 환자 사이를 연결해주던 끈이었다. 의사들은 청진기를 통해 환자의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청진기가 서서히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따뜻했던 '소통의 통로' 역시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주 의사국가시험이 있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 술기 시험도 통과해야 하는데 청진을 포함한 신체 진찰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학생들이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청진을 시행하기 전 청진기의 판을 자신의 손으로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쇠붙이인 청진기 판이 환자의 몸에 닿을 때 차갑게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작은 배려다.
새봄이 오면 새하얀 가운을 입은 '새내기 의사'들이 환자들 곁으로 찾아온다. 그들의 목에도 청진기가 걸려 있을 것이다. 환자를 위해 자신의 체온으로 청진기를 데우던 그 초심을 늘 잃지 않기를 바란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