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 시내에는 일본 신사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다. 옛 이름은 '서경사'(西慶寺)다. '서경주에 있는 사찰', 교회 이름으로 치환하자면 '서부교회'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경주읍성 안에서도 서쪽에 있었다.
우리네 산사가 도심에 있는 듯해도 이질감은 뚜렷하다. 이질감은 우선 지붕에서 흐른다. 지붕이 건물 본체의 절반이다. 비가 많이 오는 일본 특유의 지붕 양식이다.
신사라 주장하는 이도 예전엔 간혹 있었다. 일본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1월 1일이면 부리나케 신사나 사찰에 가서 '初詣'(하츠모우데='첫 참배' '첫 기원'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를 하니 신사와 사찰을 동류항으로 설정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통상 일본 신사 입구에 보이는 도리이(鳥居)가 안 보인다.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
국내에는 서경사와 닮은꼴 하나가 더 있다. 전북 군산의 동국사다. 동국사는 현재도 사찰이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이라 칭하는 이들도 있다. 엄밀히 말해 사찰 기능이 없어서 그렇지 건축물로는 서경사도 일본식인데 살아남은(?) 건물이다.
서경사는 조동종(曹洞宗)이라는 종파의 사찰이었다고 한다. 일제는 조선반도 곳곳에 170곳이 넘는 사찰이나 포교원을 세웠다. 조선에 있는 일본인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예나 지금이나 포교에는 국적이 없다. 조동종을 비롯해 각종 종파가 조선의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경주에 서경사가 건립된 건 1932년. 흰 포목에 둘러싸인 나무기둥들이 감포항을 통해 대거 경주읍성 안으로 왔다고 한다. 올해 초 발간된 '남기고 싶은 경주 이야기'에 실린 김기조 전 경주문화원장의 회고가 흥미롭다.
"해방되고 나서 내가 17살이었는데 그때 동네 악동들이 일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 서경사를 뒤졌던 거야. 그런데 지하실에서 해골, 죽은 사람 뼈가 옷에 감겨 있었다는 거지. 제를 지낸 일본 사찰이니까. 안 찾아간 일본인 유골인 거지. 지금도 지하실이 있을 거야."
건물 내부가 궁금해졌다. 유리창이 많아 채광에 유리할 것 같지만 청소하기엔 여간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미닫이문을 열었다. 우리 식으로 바꿨을 거라 짐작했는데 바닥엔 1.65㎡(0.5평) 크기의 다다미가 온통 깔렸다. 검은 마룻바닥이 다다미 틈새로 보였다. 불상을 모셨을 것으로 짐작되는 공간은 높이를 달리해 구분돼 있었다.
이곳은 2006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 농촌지도소, 사방관리소, 해병전우회 사무실 등으로 사용자가 자주 바뀌었다. 이후에도 경북도 무형문화재인 가곡의 전수관으로 사용됐고, 현재는 판소리 전수관으로 5년째 사용 중이다.
서경사가 일본 건축학도들, 일본 불교인 조동종 신자들이 경주 관광 때 즐겨 찾는 곳이어서 일본에 판소리를 알리는 기회가 된 것은 '뜻밖의 수확'이다. 경주시의 '빅픽처'(Big Picture)인지 궁금해져 전수관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경주시가 설마 (그런 깊은 생각을 갖고) 그랬겠냐. 전수관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 겨우 내준 공간이 여기"라는 답이 돌아왔다.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경주시는 2008년 4억원을 들여 서경사 옆에 '한일우호공원'을 조성했었다. 구태여 10년 전 이야기를 들쑤셔 뭣하겠냐만 현재 한일우호공원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무ㅡ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공사가 한창이었다. 판소리, 가곡, 가야금병창 등 전통예술 전수관을 일본식 옛 사찰 옆에 짓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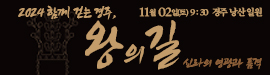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