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수선하다. 책꽂이에 꽂힌 이 책 저 책을 펼쳐보아도 들뜨고 엉킨 생각들이 차분해지지 않는다. 그 무엇인가로 이 습기를 털어내야만 할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하다. 그때 눈길이 가 닿은 것이 한강의 소설 『흰』이다. 마치 백지로 돌아가고픈 것이 본능이듯 바깥 풍경을 배경으로 깔고 책 속으로 걸어갔다.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신작 소설 『흰』은 작가로부터 불려나온 흰 것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1-나, 2-그녀, 3-모든 흰, 이렇게 세 개의 고개를 넘어가며 마치 우리네 한평생을 아우르듯 둥근 적막을 안고 간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시 같은 소설이다.
"흘러내리는 촛농은 희고 뜨겁다. 흰 심지의 불꽃에 자신의 몸을 서서히 밀어 넣으며 초들이 낮아진다. 서서히 사라진다.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들을 건넬게.//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게.//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 (39쪽) '초'의 일부분이다.
태초의 그 무엇이듯 단어들은 자근자근 속삭이며 때로는 나스르르한 솜털로 얼굴을 문지른다. 굳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며 해바라기라도 한 송이 피울 것 같다. 하지만 바닥을 향해 가라앉는 희미한 몸짓의 그림자가 있다. 부여받은 슬픔을 잉태한 채 다가올 희망을 이유로 단지 시간을 디디고 있을 뿐이다.
혼란스러운 무질서 안에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는 신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듯이, 삶이라는 것으로 심장을 문지를 수밖에 없다. 모든 흰, 그 흰 것들 속에는 모태의 근원을 찾아가는 수행의 길이듯 검푸른 빛깔들이 질척거리는 밤길을 걷고 있다.
"새의 깃털처럼 머리가 하얗게 센 다음에 옛 애인을 만나고 싶다. (중략) 완전히 늙어서……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꼭 그때./ 젊음도 육체도 없이./ 열망한 시간이 더 남지 않았을 때./ 만남 다음으로는 단 하나, 몸을 잃음으로써 완전해질 결별만 남아 있을 때."// (91쪽) '백발'의 일부분이다.
참으로 뜨거웠던 시간은 빛과 어둠 사이에 꼭꼭 숨어서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딱딱한 기억의 덩어리가 생각의 끝을 좇아 아릿한 악수를 청할 뿐이다. "잘랄루딘 루미의 두레박처럼 어두운 샘에서 물을 길어 환한데 쏟아 붓는다" 이 또한 한 무더기의 꽃을 피웠다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사라질 짧은 멜로디로 점, 점을 찍을 뿐이다.
어쩌면 우리는 완전한 결별을 꿈꾸며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길을 걷는지도 모른다. 이 소설은 햇빛이 쨍쨍한 한낮에도 가슴이 서늘하다. 깨끗해지고 싶은 영혼의 기도처럼, 삶의 물결들이 뒤척인다. 이 세상을 걷는 동안, 절망보다는 희망의 끈을 굳게 잡으며, 사랑하며 살아야 할 힘을 우리에게 숭배하듯 건넨다.
정화섭 학이사독서아카데미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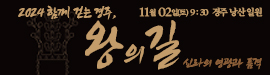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