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이 2일 세계 국가 인구 순위 및 미래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은 올해 6월 UN(유엔)이 발표한 201개국 기준 세계인구전망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가 바탕이 됐다.
2019년 기준 세계 인구수 30위권 국가는 이렇다.
〈순위 / 국가 / 인구 / 세계 인구 대비 비율〉
1위 / 중국 / 14억3천400만명 / 18.6%
2위 / 인도 / 13억6천600만명 / 17.7%
3위 / 미국 / 3억2천900만명 / 4.3%
4위 / 인도네시아 / 2억7천100만명 / 3.5%
5위 / 파키스탄 / 2억1천700만명 / 2.8%
6위 / 브라질 / 2억1천100만명 / 2.7%
7위 / 나이지리아 / 2억100만명 / 2.6%
8위 / 방글라데시 / 1억6천300만명 / 2.1%
9위 / 러시아 / 1억4천600만명 / 1.9%
10위 / 멕시코 / 1억2천800만명 / 1.7%
11위 / 일본 / 1억2천700만명 / 1.6%
12위 / 에티오피아 / 1억1천200만명 / 1.5%
13위 / 필리핀 / 1억800만명 / 1.4%
14위 / 이집트 / 1억명 / 1.3%
15위 / 베트남 / 9천600만명 / 1.3%
16위 / 콩고민주공화국 / 8천700만명 / 1.1%
17위 / 독일 / 8천400만명 / 1.1%
18위 / 터키 / 8천300만명 / 1.1%
19위 / 이란 / 8천300만명 / 1.1%
20위 / 태국 / 7천만명 / 0.9%
21위 / 영국 / 6천800만명 / 0.9%
22위 / 프랑스 / 6천500만명 / 0.8%
23위 / 이탈리아 / 6천100만명 / 0.8%
24위 / 남아프리카공화국 / 5천900만명 / 0.8%
25위 / 탄자니아 / 5천800만명 / 0.8%
26위 / 미얀마 / 5천400만명 / 0.7%
27위 / 케냐 / 5천300만명 / 0.7%
28위 / 한국 / 5천200만명 / 0.7%
29위 / 콜롬비아 / 5천만명 / 0.7%
30위 / 스페인 / 4천700만명 / 0.6%
54위 / 북한 / 2천600만명 / 0.3%
또한 2067년 예상 세계 인구수 10위권 국가는 이렇다.
〈순위 / 국가 / 2067년·2019년 인구 및 순위 변화〉
1위 / 인도 / 16억4천만명 (2019년 2위(13억6천600만명)에서 인구는 증가, 순위는 ▲1 )
2위 / 중국 / 12억8천만명 (2019년 1위(14억3천400만명)에서 인구 감소, 순위는 ▼1)
3위 / 나이지리아 / 5억2천800만명 (2019년 7위(2억100만명)에서 인구 증가, 순위도 ▲4)
4위 / 미국 / 4억명 (2019년 3위(3억2천900만명)에서 인구는 증가, 순위는 ▼1)
5위 / 파키스탄 / 3억8천200만명 (2019년 5위(2억1천700만명) 인구는 증가, 순위는 〓)
6위 / 인도네시아 / 3억3천700만명 (2019년 4위(2억7천100만명) 인구는 증가, 순위는 ▼2)
7위 / 콩고민주공화국 / 2억6천100만명 (2019년 16위(8천700만명)에서 인구 증가, 순위도 ▲9)
8위 / 에티오피아 / 2억5천만명 (2019년 12위(1억1천200만명)에서 인구 증가, 순위도 ▲4)
9위 / 브라질 / 2억1천900만명 (2019년 6위(2억1천100만명)에서 인구는 증가, 순위는 ▼3)
10위 / 이집트 / 1억8천900만명 (2019년 14위(1억명)에서 인구 증가, 순위도 ▲4)
15위 / 러시아 / 1억3천만명 (2019년 9위(1억4천만명)에서 인구는 증가, 순위는 ▼6)
24위 / 일본 / 9천300만명 (2019년 11위(1억2천700만명)에서 인구 감소, 순위도 ▼13)
28위 / 독일 / 7천700만명 (2019년 17위(8천400만명)에서 인구 감소, 순위도 ▼11)
29위 / 영국 / 7천600만명 (2019년 21위(6천800만명)에서 인구는 증가, 순위는 ▼8)
56위 / 한국 / 3천900만명 (2019년 28위(5천200만명)에서 인구 감소, 순위도 ▼28)

◆한국 인구, 일본 3분의 1 수준으로
2019년 세계 인구 순위에서 한국은 28위(5천200만명)이다. 그런데 2067년에는 56위(3천900만명)로, 현재 순위만큼인 28계단 하락할 예정이다. 48년 동안 1천300만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해 0명대 출산율(0.98명)을 처음 겪은 한국은 이어 9년 뒤인 2028년까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2029년부턴 감소세로 전환하게 된다.
지금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나라인 일본은 2019년 1억2천700만명인 것이 1억대 인구가 깨져 2067년 9천300만명이 되는데, 이는 그래도 세계 24위 수준이다. 그런데 인구수를 따져보면 현재 일본의 절반 수준인 한국은 48년 뒤에는 일본의 1/3 수준이 돼 버린다. 인구가 국력에 늘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늘 여러 영역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기 때문에, 인구 변동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다만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 인구까지 통합해 계산하면, 사정이 좀 나아진다. 2019년 대한민국 인구가 5천200만명, 북한 인구가 2천600만명으로 총 7천800만명이다. 이게 2067년에는 6천500만명(대한민국 3천900만명, 북한 2천600만명(단독으로는 세계 71위)이 되고, 이는 세계 36위이다. 오히려 일본을 따라잡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다만 이번 전망에서는 북한 인구 자체가 48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봤고(2038년부터 소폭 감소세 시작 예상),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구 총합에 합산하긴 부적합할 수 있다. 아무래도 북한 인구도 예상보다 더 감소한다고 봐야 한다.
사실 미래 전망을 살펴보면 향후 인구가 감소할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2019년 30위권 내 국가들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태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등 9개 나라에 불과하다. 과거부터 이어진 유럽의 저출산 추세만큼, 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된 동북아 3국 한·중·일의 인구 감소세로의 전환이 눈길을 끈다.
◆2067년 세계 인구 1위 인도·2위 중국·3위 나이지리아
중국은 세계 인구 추정 및 집계가 이뤄진 때부터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와 함께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에는 아예 인도에 1위 자리를 넘겨주고 줄곧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8년 뒤이다.
2067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이집트,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케냐 등이다. 이 가운데 나이지리아가 2019년 7위에서 2067년 3위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2019년 3위인 미국을 2067년 4위로 밀어내게 된다.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콩고민주공화국(16위→7위), 에티오피아(12위→8위), 이집트(14위→10위)도 순위가 크게 올라 2067년 세계 인구 10위권 안에 진입하면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인구 대국이 된다. 10위 안에 아시아가 네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도 네 나라가 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총인구는 2019년 13억800만명에서 2067년 31억8천만명으로, 3배 가까이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 아시아의 경우 인도와 파키스탄 및 동남아 다수 국가들은 늘어나는데 한·중·일 등 동북아 다수 국가들은 줄어들어 서로 상쇄되는 영향으로, 총인구가 2019년 46억명에서 2067년 52억3천만명으로 6억여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과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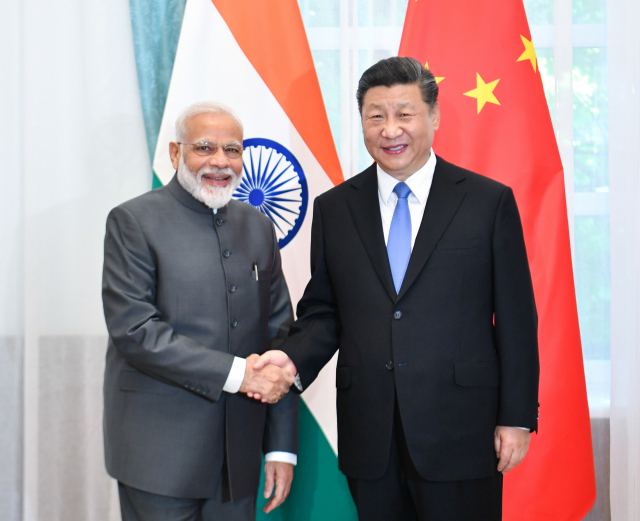
◆아프리카 인구 폭증 "기회 or 부담"
아프리카는 미래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젊어지기도 한다. 2067년 예상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이 64.3%로 모든 대륙 가운데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겨우 7.9%로 전 대륙 중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풍부해지는 노동력 및 커지는 시장 등의 '활력'을 세계 경제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전망은 일부 국가에만, 그런 국가에서도 몇 개 번화한 도시 지역 정도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륙과 달리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현재 전 세계 기아의 20%를 차지해 기아가 가장 많은 대륙이고, 높은 빈곤율, 에이즈 같은 질병,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 일부 국가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의 문제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대부분 국가에 오히려 부담 요소일 수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 발전의 기회는 결국 그 나라의 정치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인데, 향후 아프리카에서 자유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는 국가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48년 뒤 노인이 절반" 너무 늙은 대한민국
한국은 아프리카와 정반대 상황을 겪는다. 2067년 예상 대한민국의 연령별 인구 비중은 이렇다.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이 8.1%,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이 45.4%,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46.5%.
이는 같은 시점 예상 기준 아시아의 유소년인구 비중이 16.3%(한국은 절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61.4%(한국은 3분의 2), 고령인구 비중이 22.3%(한국은 2배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상태를 짐작케 한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은 세계 상위권도 아니고 1위가 된다. 46.5%란 수치는 세계에서 유일한 40%대이다. 같은 시점 기준으로 일본(38.1%)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를 가리키는 노년부양비는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로 급증, 세계 최고 수준의 부양 부담을 보일 전망이다.
그만큼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한국에서의 취업, 결혼이민 등 목적 외국인 유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순유입 인구는 2005~2010년 연평균 5만2천명정도였던 게, 2015~2020년 연평균 9만7천명정도로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는 동남아 다수 국가들의 인구 증가와도 계속 연결고리를 맺을 전망이다. 지난해만 봐도 한국의 순유입 국가 순위 1위가 태국(4만1천여명), 2위가 베트남(2만8천여명), 3위가 중국(1만9천여명)이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