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한 학생이 찾아와서 문득 이렇게 묻는다. "민족이 뭔가요? 이 개념은 쉬우면서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생의 개념적 혼돈이 충분히 이해되어 되받아 물었다. "민족, 종족, 인종 등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혹시 다문화 관련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한 의문이 생겼나요?" 학생이 고개를 끄떡였다.
이 학생의 물음처럼 우리의 교육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민족'이란 개념은, 그 본래적인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용어가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를테면 해외 동포 문제나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룰 때는 어김없이 '민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민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나라 성씨의 절반가량이 외부에서 유입된 성(姓)이며, 역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결코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능하면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사실 세계사에서 민족이란 개념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대 이후의 일이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없어지면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나라가 없어졌으니 그 대신에 민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너무나 친숙하다. 예컨대 '추석, 민족 대이동'이라든가, 혹은 '한민족인 해외 동포'라는 표현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엄밀히 구분해서 종족이나 인종, 그리고 민족은 다른 개념이다. 먼저 종족은 부족이나 씨족처럼 혈연집단을 의미하며, 인종은 인간을 신체적 특징으로 분류할 때 사용되는 범주이다. 그리고 민족은 문화적 공통 특징, 즉 언어'종교'사회 조직'생활 양식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범주이다. 여기에는 문화적 공통점이라는 특성이 내재해 있다. 이런 이유로 전통문화를 소개할 때 '우리 민족'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물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알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사고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생각해 보라. 아마도 197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할 것이다. 이 헌장을 외우지 못한 학생들은 교실에 남아야만 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토록 열심히 외웠던 추억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이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고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민족' 대신 '국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간 왕래가 많은 글로벌 시대에서는 이러한 민족 개념이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혈통 중심의 '민족 공동체'보다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문화 공동체' 혹은 '공동 운명체'이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부터 '단일민족'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처럼 다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낡은 '민족' 개념보다는 '국민'이 더 소중하게 인식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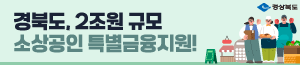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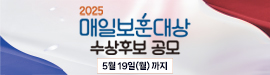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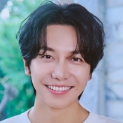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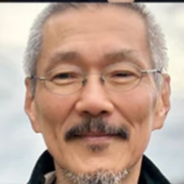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확정…TK 출신 6번째 대통령 되나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민주당도 동의해야"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文 "이재명, 큰 박수로 축하…김경수엔 위로 보낸다"
이재명 "함께 사는 세상 만들 것"…이승만·박정희 등 묘역참배